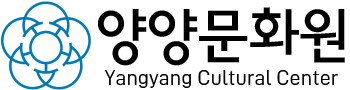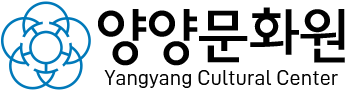338. 풍악록(楓岳錄) 백호(白湖) 윤휴(尹鑴) / 한글 번역 2
페이지 정보
본문
14일(병진) 새벽에 빈일료(賓日寮)에 나가 일출광경을 보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비가 올 징후가 있어 붉은 노을이 남북을 통해 하늘에 질펀하였고 만경창파 같은 구름 물결이 끝도 없이 하늘을 띄워 보내고 해를 목욕시킬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하늘 밖에 나가 놀게 만들었다. 조금 후 하늘은 금방 변하여 새벽빛이 다시 짙고 하늘 끝도 희미했다. 태양은 비록 뜬구름에 가려 있었지만 구름이 변화하는 태도라든지 별스 럽게 자꾸 바뀌는 모양은 보기에 이채로웠다. 그날은 기일(忌日)이었기에 혼자 빈일료에 앉아서 재계하였다. 늙은 스님 비경(秘瓊)이라는 자를 불러 함께 얘기하다가 최간이(崔簡 易)가 읊었다는 운(韻)자를 들었는데 운자만 있고 시는 없었다. 그 운자에 차운하여 써 주고, 또 벽상에 걸려 있는 홍녹문(洪鹿門)、정동명(鄭東溟) 운에도 차운하였다.
동해의 동쪽에는 낙산사
부상에서 해가 뜨면 온 하늘이 붉은 빛
절간의 이른 새벽 향 피우고 앉았으니
상서로운 보랏빛 구름 기운 속에 있는 듯하여라
洛寺寺臨東海東
扶桑出日滿天紅
上方淸曉燒香坐
身在祥雲紫氣中
위의 시는 간이의 운에 차운한 것이고,
설악산 동해의 낙가정에서
붉은 해가 푸른 하늘로 오르는 걸 보았네
바다와 산이 다한 곳에 이름난 고장 있어
육경에 뛰어난 호걸스런 사람 같네
雪嶽東溟洛伽亭
直窺紅日上靑冥
海山窮處名區在
却似人豪出六經
위의 시는 동명의 운에 차운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차운하였다.
우주 개벽 어느 때에 열렸는가
이 절은 신라 시대에 지었다네
새는 구름 저 멀리로 사라지고
돛단배 저 하늘 밖에서 오네
바람 일자 파도는 태양을 흔들고
늦가을 객은 대에 오르네
바다 삼 천 리를 돌아보니
이 정자가 참으로 장쾌하구나
宇宙幾時闢
禪宮羅代開
鳥向雲邊滅
颿從天外來
風生波盪日
秋晚客登臺
遵海三千里
玆亭實快哉
또 한 수는,
위치는 산하 좋은 곳 차지하여
창은 바다 쪽으로 향해 있네
하늘 밖에서 흰구름 일고
붉은 해가 밤중만 온다오
바람은 금선굴 흔들고
파도는 의상대를 절구질하네
동쪽 가 살고픈 뜻이야 있지만
나를 따를 자가 누구인가
地占山河勝
窓臨溟海開
白雲天外起
紅日夜中來
風撼金仙窟
波舂義相臺
居夷夙有意
從我其誰哉
하였다.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차운하였다. 정동명의 원운(元韻)은, '임지로 가는 유열경 (柳悅卿)을 보내며'이다.
바닷가 정자에 나무마다 배꽃이 만발하고
낙산의 바다는 아득하구나
관청에 일이 없어 종일토록 한가하니
모름지기 낙산에서 대제경이나 읽으리라
萬樹梨花海上亭
洛山邊海海冥冥
訟庭竟日閒無事
須讀扶桑大帝經
하였고, 홍녹문의 원운은, '낙산사에서 노두(老杜)의 운으로' 인데,
이곳이 용왕의 집자리인가
어느 해에 절이 열었는가
하늘은 푸른 바다에 떠가고
산은 백두산에서 왔다네
地卽龍王宅
何年梵宇開
天浮靑海去
山自白頭來
가을 풍경을 실컷 보고
석대에 올라 쉬었네
여기에 올라 세월의 무상함을
생각하니 이런 일 저런 일 끝이 없어라
縱目觀秋色
扶笻倚石臺
登臨撫今古
俯仰恩悠哉
했으며, 손홍우 희(孫洪宇熙)는 차운하기를,
창파가 아득하여 끝이 없는데
천지는 언제쯤 개벽되었던가
옛 절엔 가을빛이 다해가는데
모래밭으로 물새들이 오는구나
시 읊조리며 옛일 더듬어도 보고
먼 곳 바라보며 누대에 앉았네
황학이 한번 날아가니
흰 구름이 왜 그리도 먼가
滄波杳無際
天地幾時開
古寺秋光盡
明沙海鳥來
吟詩憶舊迹
騁眺坐寒臺
黃鶴一飛去
白雲何遠哉
하였다. 그리고 그 날 비경이 최간이가 시 두 수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하나는,
옛날 누대에서 일출을 바라보면 기이하다고 들었는데
달은 한가위 해마다 기간이구나
이 날 이 때 장맛비를 만나니
하늘이 날 영동에서 시 쓰라고 잡아 두었네
樓觀海日昔聞奇
月得中秋一歲期
此日此時逢久雨
天公停我嶺東詩
라고 읊었으니, 이 시는 낙산(洛山)을 읊은 것이고, 또 십칠조(十七朝)라는 시는 이렇다.
높고 높은 하늘 달이 진 후 동쪽에서
갑자기 만경창파가 붉게 붉게 끓더니
굼틀굼틀 온갖 괴물들은 모두 다 어디가고
채색 구름 속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네
玉宇迢迢落月東
波萬頃忽翻紅紅
蜿蜿百怪皆如畫
擎出金輪彩霧中
이상의 시들은 최공(崔公)이 간성 유수로 있을 때 판각해서 달아 두었던 것으로 언젠가 화재로 그 현판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는데, 어느 선비 집에 남아 있던 이 시를 비경 이 나에게 보여 주기 위해 베껴 온 것이다 그리고 또 정수몽(鄭守夢)이 유수로 있으면서 비경에게 준 사운시(四韻詩)도 읊기에 그럴 만하여 역시 베끼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좌 중에다 말하기를,
“선배들은 별것 아닌 이 시 한 수까지도 그렇게 관심들을 가졌었는데 어찌해서 지금 후 배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도 없는지 모르겠어.”
하였다. 정수몽의 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적을 수가 없으니, 일행들에게 다시 물어 보 아야겠다. 그 중의 시축에는 요즘 여러 사람들 시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었다.
15일(정사) 흐림. 가랑비가 싸늘하게 뿌리다가 그쳤다. 기신(忌辰)이라 좌재(坐齋)하면서 《주역》을 읽었고 부리(府吏)를 시켜 일록(日錄)을 베끼게 하였다 또 어제 유군을 통해 눌승(訥僧)에게서 얻은 향언지로가(鄕言指路歌)는 퇴계(退溪)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볼 때 학문에 조예가 없이는 지을 수 없는 내용으로 역시 후일 아이들 의 영가(詠歌) 자료로 삼기 위해 베껴 두게 하였다.
영덕 현령(盈德縣令) 심철(沈轍)이 지나다가 절에 들러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는 데 그는 고 판서(判書) 집(謝의 손자이고, 사간(司諫) 동구(東龜)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 날 또 두 군을 통해 김 장군 응하(金將軍應河)의 애사(哀詞) 두 편을 들었는데, 둘 다 읊 을 만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억할 수가 없어서 추후 기록하기로 하겠다. 말이 난 김에 명(明) 나라 희종(熹宗)이 김응하를 포증(褒贈)한 일에 관해 말을 해야겠기에 내가 두 군 들에게, 당시 명 나라에서 포증할 때 천자로부터 조서(詔書)가 있었는데 그 조서를 보았 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보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명문이 아니냐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건 그렇지 않다. 나도 그 조서를 읽어 보았지만 누가 초안한 것인지 알 수도 없거니 와 천자가 자칭 과인(寡人)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김군(金君)을 수양(睢陽)의 장순(張巡), 승상(丞相) 문천상(文天祥)에게 비유하여 말하기를, '장순(張巡)、허원(許遠)이 죽지 않았 더라면 당(唐) 나라 왕실에 신하가 없는 폭이고, 문천상이 죽지 않았더라면 송(宋) 나라 왕실에 신하가 없는 폭이며, 장군이 죽지 않았던들 과인의 나라에 신하 없는 폭이 되었 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뜻이 전도되고 사체(事體)를 모르는 정도가 심하였다. 또 문장 의 표현 방법까지 서툴고 껄끄러워 마치 고문(古文)을 흉내 내 보고자 하였으나 문장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남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천자 나라에서 외국 신하를 포 증하려면 조서를 만들 때도 반드시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해야 할 것인데, 지어 놓은 글이 그 모양인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만하지 않은가.” 하였다.
내 언젠가 또 숭정(崇禎) 연간에 황 감군(黃監軍)이 나왔을 때 그가 읊었다는 시를 보았 는데, 내용이 말도 못하게 거칠고 추하고 졸렬한데도 그 자신은 그것마저도 모르는지라 장계곡(張谿谷)이 그의 작품을 써 놓고 비웃었다는 것이다. 듣기에 그 황은 진사(進士) 출신으로 조정에 오른 이후 우리나라를 왕래할 정도였으니 역시 한때 쟁쟁한 인물이었 을 것인데도 그 모양이니 인재가 쇠할 대로 쇠해 세상이 오래 못 가리라는 징조인 것이 다. 문장(文章)이라는 것이 비록 별것은 아니로대 한 시대의 성쇠가 거기에도 그렇게 반 영되는 것이다. 아, 후세 사람들이 지금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옛날을 보는 것보다 오히 려 더 못 할런지 어떻게 알겠는가.
16일(무오) 새벽에 일어나 창을 밀치고 일출 광경을 보았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다도 활짝 개어 동쪽이 밝기도 전에 서광(瑞光)이 만 길이나 치솟고 있었고 뭇별들은 이미 드문드문해져 함께 빛을 겨룰 만한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하늘가에 갑자 기 구름 같은 것이 띄엄띄엄 생기면서 가릴 듯이 하더니 막상 붉은 기운이 점점 무르익 자 그것들은 녹은 듯이 없어지고 다만 금물결이 만 리나 뻗어 하늘과 물이 서로 밀고 당 기는 것과 같은 것만 보였다. 그것은 화륜(火輪)을 달구느라고 홍로(洪爐)가 너무 뜨거워 바다 전체가 끓고 있는 것과 같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태양 궤도가 잠겼다 떴다 하면 서 뛰어도 뛰어도 오르기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잠시 후 태양이 불끈 솟자 위아래에서는 서로 받들고 좌우에는 상서로운 구름 자색 서 기가 무수히 깔려 있어 마치 그것들을 타고 올라온 것 같기도 했다. 이에 해는 둥실둥실 떠오르고 그 빛은 아래로 내리쪼여 바다는 바다대로 깊고 넓게만 보이고 하늘은 하늘대 로 높고 크게만 보였으며, 상하 사방이 똑같이 밝아지고 삼라만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 다. 실로 천지간의 일대 장관이었다. 날마다 기다렸지만 그때마다 뜬구름이 가리더니 오 늘에야 비로소 장쾌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밝음 속에도 어딘가 일말의 그 무엇이 살짝 가린 빛을 띠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마 겸손해야 하고 밝음을 숨겨야 하는 천지조화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뜻이 아닐런지 나로서는 감히 결 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어 생각하면 모든 물건의 이치가 각기 종류별로 움직이고 형상에 의해 동화되고 있 는데 그것을 달리 비유하면 마치 군자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소인이 나타나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세상은 항상 드물고 어지러운 세상이 언제나 많은 것과도 같 다고 하겠다. 그러나 군자가 참으로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하여 세상이 치평을 향 해 치닫게 되면 저 소인이라는 것들은 풀이 죽어 자취를 감추거나 아니면 과거를 청산 하고 이쪽으로 심복해 오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쪽에 병통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말을 따르고 받들면서 우리 쪽의 쓰임이 될 것이다. 문제는 군 자 자신이 자기를 소명하고 순수하고 밝은 덕을 길러 음(陰)을 저 땅 밑에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높고 밝은 위치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세상을 맡아 다스리는 자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양웅(揚雄)의 『太玄經』에 이르기를, “태양은 날고 음은 매달려 있으면 만물이 화락하리라.”
하였다. 그를 해설한 자의 말에 의하면, 태양은 군자를 말하고, 매달려 있다는 것은 녹아 없어짐을 뜻하며, 음은 소인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군자의 기가 성하면 뭇 음은 저절 로 없어진다는 뜻으로 바로 오늘에 필요한 점괘인 것이다.
이 날도 기신이어서 재계하면서 앉아 있었다. 밤에 비는 개고 달은 기망(旣望)이어서 바다에 뜨는 달을 또 구경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17일이 진짜 보름이어서 그런지 해가 서산에 채 지기도 전에 달이 이미 동천에 솟아 있었고, 막 눈을 들고 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달이 벌써 구름 끝에 나와 있었다. 저녁이 되어 스님 몇 사람과 함께 걸어서 이화정(梨花亭)에 나갔더니 중천에 솟은 달이 바야흐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그 빛은 바다 밑까지 비치고 있었으며 만경창파는 은물결로 변하여 위아래가 모두 마치 벽유리 (碧琉璃)와도 같았다. 이윽고 바람이 해면을 스치자 파도가 넘실대고 달은 그 속을 출몰 하니, 마치 삼켰다 뱉았다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 같았고, 또 잠시 후 하늘을 보았더니 높고 높은 푸른 하늘에는 외로운 달만이 천천히 옮겨 가고 있었다. 고인이 이른바, '사방 에 구름 걷히고 은하마저 없는 하늘(纖雲四卷天無河) 일 년 중에 오늘 밤 달이 제일 밝 네그려(一年明月今宵多)'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한 말인 듯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광채는 비록 일출을 볼 때만큼 장엄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 맑고 밝고 깨 끗한 자태로 태양을 대신해서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천하의 훌륭한 구경거리였 다. 천지 음양의 이치가 서로 양보라도 하듯이 하나가 차면 하나는 비는 것으로, 옛 분 들이 말했던, '백옥반(白玉盤)、요대경(瑤臺鏡)' 같은 말로는 지금 이 광경을 비교 표현하 기에 부족한 바가 있는 것이다. 중 비경 등이, 오늘 밤 달빛은 일 년 중 보기 드문 달빛 이라고 한 말에 대해 나도 동감을 하였다. 이미 일출 광경을 보았고 지금 또 중추(中秋) 의 밝은 달까지 보았으니 이만하면 이번 걸음은 헛걸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 삼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서 두 군들을 불러내어 같이 구경하다가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대고 밤기운이 너무 시원해서 요사(寮舍)로 들어가 『주역』 계사(繫辭)를 종편까 지 읽었다. 향을 가져와 피우게 했더니 중이 침향(沈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기에, 내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그대들은 이름만 취택하고 실물은 취택하지 않는군. 중국에서 말하는 침향이라는 것은 바로 나무 이름인데 남국(南國)에서 나는 나무야. 지금 그대들이 물속의 썩은 나무를 가져다가 부처 앞에다 피우면서 그것을 아주 향기로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 게 이름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하였다. 다시 흑단(黑檀)을 가져와 피우게 하였다. 흑단은 시속 말로는 노가자(盧柯子)라 고 하는 것으로 그 향기가 매우 맑았다. 또 중향성(衆香城)에서 얻어 왔다는 도로파(都盧 芭)도 피워 보았는데 그것은 향기가 천궁 비슷하면서 역시 정신을 상쾌하게 해 주었다.
내 이어 생각해 보니, 광풍제월(光風霽月)은 주무숙(周茂叔)의 가슴 속을 상징하는 말이 고, 서일상운(瑞日祥雲)은 정백순(程伯淳)의 가슴 속을 상징하는 말이며, 태산교악(泰山 喬岳)과 해활천고(海闊天高)는 또 주회옹(朱晦翁)의 기상을 그린 것인데, 내 사실 이번 걸음에 그러한 것들을 다 직접 보고 정신적으로 느껴 보았고, 일만 겹의 봉래산과 동해 의 구름 물결 그리고 해돋이 때의 눈부신 광채와 휘영청 밝은 가을 달도 내 모두 살펴보 고 희롱해 보았다. 게다가 또 하늘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비, 바람, 구름, 먼 지 등으로 훼방을 놓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가령 안문(鴈門)의 가을비, 죽포(竹浦) 의 거센 파도, 낙산(洛山)의 찬이슬 같은 것은 풍백(風伯)' 우사(雨師)가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준 작품들로서 누군가가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번의 이 기회를 단순히 구경만 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무엇인가 마음속으 로 생각하여 터득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산요수 그리고 호연지기라는 것과도 상 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천 년 전의 고인들을 만나 본 것과도 같을 것이다.
해돋이 구경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를 지어 그 일을 적어 둔다.
해 뜰 때 바다의 경치를 바라보니 看看海色候扶桑
떠가는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常恐浮雲穢太淸
눈부신 해가 갑자기 나타나서 忽覩爀曦懸陰處
천 길이나 뻗는 광선 천지사방 다 비추네 千丈毫光六合明
그리고 낙산중추월(洛山中秋月)을 두고는 노소재(盧蘇齋)의 '청간정(淸澗亭)' 운자로 읊었는데,
바다에 뜬 달은 가을 들어 더 밝고
거센 파도는 밤바람에 일어라
절 방에 외로이 누워 있으니
뭇 생각이 다 사라지는구나
海月當秋白
鵬濤入夜風
禪窓孤臥處
萬慮落眞空
하고, 또 읊기를,
맑은 것은 한가위의 달빛이요霽色中秋月
파도소리 큰 바다 바람이어라波聲大海風
그 소리 그 빛깔 말고도須知聲色外
텅 빈 하늘이 또 있다네更有寂寥空
하였다.
아침에는 심군철(沈君轍)이 왔다가 갔고, 저녁에는 간성 군수 윤세장(尹世章)이 동해신 (東海神) 제사의 예차관(預差官)으로 와서 이 절을 지나다가 여러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또 나를 와서 보았는데, 윤(尹)은 바로 윤 상공 해원(尹相公海原)의 증손이요 윤 판서 이 지(履之)의 손자라고 했다. 대옥 역시 동해신 제사 일로 저녁에 떠나면서 내일 다시 오겠 다고 했는데, 감사(監司)와 도사(都事)가 부(府)에 온다는 말을 듣고 하직을 고하고 떠난 것이다.
낮에 그 곳의 중 몇 사람과 함께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관음굴(觀音窟)을 바라보았더 니 작은 집 하나가 파도에 의해 무너져 있었다. 대(臺) 위에 앉아 잠시 물결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정(鄭)군과 유(柳)군이 내게로 와 함께 잤다. 그날 사눌(思訥)이라는 중이 영남 태백산에서 와 그 절을 위해 예불(禮佛)을 하고 있었다. 그 중은 방에서 혼자 거처하며 밤 5경이면 일어나서 불전에 향을 올리는데, 낮에도 자지 않고 밥도 하루 한 끼만을 먹 으면서 언제나 시간 맞추어 염불을 했다. 내가 데리고 얘기해 보니 그는 선정(禪定)의 설 을 듣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자였다. 내가 묻기를,
“노선(老禪)께서 마음 공부를 하신 지가 오래인 모양인데 지금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까지 갔습니까?”
하자, 그는 그렇다고 하면서 아무리 어지럽고 화사한 성색(聲色)을 듣고 보아도 그것을 안 보았을 때와 똑같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색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제어하기가 쉽지만 마음에는 유주상(流注想)이라는 것이 있 어 바로 온갖 잡념이 때없이 왕래하는데, 노선께서는 마음 공부를 하여 그러한 것들도 다 제거가 되었습니까?”
하니 그는,
“공부 초기에는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온전히 없어졌지요.” 하였다. 공부를 몇 년이나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였고, 마음에 잡념 하나 일어나지 않고 혼자 훤한 것을 느낄 때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게 바로 이른바 비치지 않고 있는 거울 같고 파도가 일지 않고 있는 물 같다는 것 아 닙니까.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
- 이전글
- 338. 풍악록(楓岳錄) 백호(白湖) 윤휴(尹鑴) / 한글 번역 1
- 25.02.26
-
- 다음글
- 338. 풍악록(楓岳錄) 백호(白湖) 윤휴(尹鑴) / 한글 번역 3
- 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