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용악당대선사비(聳岳堂大禪師碑)
페이지 정보
본문
비좌(碑座), 비신(碑身), 개석(蓋石)을 갖추었으며, 비좌는 장방형으로 125cm×90cm×33cm의 크기로 상면은 각 변의 모를 둥글게 죽여 자연스럽게 경사를 주었다. 비신은 75cm×25cm×190cm로 양면에 명문 을 새긴 2면의 비석이다. 전면 개석 바로 아래의 우(右)에서 좌측(左側)으로 전서(篆書)를 이용해 용악당대선 사비명(聳岳堂大禪師碑銘) 8자(字)가 14cm×75cm의 공간에 게재되어 있다. 음기(陰記)에『광서9년계미7월 일립(光緖九年癸未七月 日立)』이 기록되어 있어 1883년 7월에 세운 것을 알수 있다. 비신(碑身)은 오석(烏 石)으로 뒷면은 비면(碑面)에 균열(龜裂)이 생겨 자칫 글자의 탈락(脫落)이 생길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개석은 균형미가 돋보이는 기와집 지붕 형태인 옥개형(屋蓋形)으로 130cm×80cm×50cm이며 전 체적으로 아름답다. 비석의 총 높이는 273cm이다.
선사의 이름은 보위(普衛)이고 속성은 김으로 본관은 김해인(金海人)이다. 남다른 재주를 갖고 태어나서 일찍 이 문사(文史)에 두루 능통했으며 18세인 1834년(순조 4년)에 양양의 명주사 학운(鶴雲)화상에게서 머리를 깍 았다. 불경에 통달하여 도반 중에는 앞서는 자가 없었다. 몽암선사로부터 선교 양종의 선지를 전해 받아 청허 당(서산대사)의 적파 자손 환성지안(喚醒志安)의 7대손이다. 학운선사께서 암자를 일으키고 열반하자 슬픔을 품고 삼년, 산문을 출입도 하지 않은 채 비석에 생존 시 흠모함을 헤아려 문체를 쪼아 새겼다. 전서와 예서로 정교하고 오묘함에 이르렀다. 모여든 많은 제자들이 글을 읽고 유교와 불 교를 분별하여 능히 말했다. 전해오는 유·불의 경전을 들락거리며 비록 유학에 머무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에 지나치진 않았다. 그가 지은 시는 슬 프면서고 굳세고 호쾌하면서도 밝았고 탁한 채식(菜食)의 기가 없었다. 선 사께서 정축(1817)년에 태어나 금년에 67세이며 승랍 50년인 1883년에 그의 법을 전하고 피안으로 건넜다. 용악당 대선사의 남겨진 작품으로는 1862년“원통암 현판”과 1864(동치3, 갑자)년 유월 상순에 쓴“원통암 상 량문”,“학운당 태선사 정원 영세불망비”가 전한다. 특히, 용악 대선사는 영세불망비에서“연파 후손 용악보위”라고 쓴 것은 5대조인 연파스님을 닮고 싶어서 사표(師表)로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연파 스님께서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사찰을 주유(周遊)하며 법(法)을 단단히 하였듯, 용악스님도 1875년“통도사 백련정사 만일승회기”가 전하는 것으 로 보아 만행(萬行)을 통해 고승들을 찾아 다닌 것으로 보인다.
■ 용악당 대선사비명 원문 해석
명나라 시대에 조선국 용악당 대선사의 비를 새기고 서문을 쓰다.
방산거사(艕山居士) 허훈(許薰) 찬(撰) 황곡 서주지(徐錫止)가 쓰고 전서체도 씀
내(용악의 수법상좌 旿珍)가 남쪽 바다 위를 떠돌며 여러 달 지내다 돌아오니 용악의 손제자(濟常)가 받아 들여 덕행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다. 스스로 큰 영을 넘어 오십유순을 달려 양주(陽州)에 와서 묘교의 농막 에 머물렀다. 이때 나는 그가 몸을 가지거나 행동하는 일을 오랫동안 보고 용모가 단정하고 말씨를 우아하게 함을 알았다. 대덕 스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중의 범절과 상복을 입는 관습도 알고 있었다. 손자의 소 매에서 조사 용악당 대화상의 행록(언행을 적은 글)이 나왔다.
빈도(수법상좌 旿珍)가 대화상을 위하여 단단한 7척의 곧고 아름다운 돌에 심오한 뜻을 잘 드러낼 사람을 찾는다고 전한 이래 오늘에 이르러서 선생의 이름을 들었다. 거리낌 없이 먼 길을 오라 하니 다행히 선생이 일언으로서 은혜를 베풀었다. 나는 이미 용악(聳岳)선사의 상황을 살펴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악 노선 사는 오히려 걱정도 없이 가부좌로 앉아서 경을 암송하고 있었다. 두루 물으니 말하길 비석은 돌아가신 일을 슬퍼함인데 선사가 지금 생존해 있으니 비석은 어찌하리요? 손제자가 선생이 이 비석을 마무리 하시길 원하 여 말씀하시니 선사께서 어떤 날 몽회(어리석고 어두움)하면 행장을 기리어 중생이 경계하도록 새기자고 완 고하게 말했다.
또 더욱 상태가 드러나자 우리 노 선사의 많은 고족제자(학식과 품행이 우수한 제자)들이 나타나 노 선사 께 정성을 다하였다.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를 선생은 종래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손제자에게 말했다. 나에 게 불가의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했다. 한 번의 죽음과 삶을 비교하면 태어남은 살기 위함이 아 니며, 죽음도 목숨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사대(지수화풍)는 잠시 머무는 객사(客舍)에 불과하다. 하나의 영혼이 지각한다는 것은 사물의 형용은 아니지만 지나온 것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과 사 (死)는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다. 만약 생사에 집착한다면 모양에 빠져들어 도에는 어두워진다. 그런즉 살아 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다.
비석을 어찌 새기는가? 처음으로 그 행장기(行狀記)를 취합하여 비문을 쓰니 선사의 이름은 보위(普衛)이 고 속성은 김으로 본관은 김해인(金海人)이다. 남다른 재주를 갖고 태어나서 일찍이 문사(文史)에 두루 능통 했으며 18세인 1834년(순조 4년)에 양양의 명주사 학운(鶴雲)화상에게서 머리 깍고 법복을 입었다. 불경에 통달하여 도반 중에는 앞서는 자가 없었다. 암자의 장로 몽암선사로부터 선교 양종의 선지를 전해 받아 청허 당(서산대사)의 적파 자손 환성지안(喚醒志安)의 7대손이다. 사찰이 우연히 만난 액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으 로 소문이 나자 학운이 재물로 대속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하는 까닭에 전대를 들추었다.
나머지도 학운선사께서 주어 암자를 훌륭하게 일으키는 것을 관장하고는 열반을 하였다. 용악은 슬픔을 품고 삼년동안 산문을 출입도 하지 않은 체 비석에 생존 시 흠모함을 헤아려 문체를 쪼아 새기었다. 재단을 설치하니 마음의 움직임도 없이 다 여법하였다. 만유의 본체로서 즐겁게 베풀었으니 타인이 가난하고 곤궁 한 것을 보면 구제가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무릇 경판을 인쇄하고 탑과 절을 세우는 재물이 축나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았으니 선근(善根)을 심는데 한량없는 공덕을 베풀었다.
모든 것을 선사(聳岳)가 하였지만 모르는 사이 신불의 도움을 받는 것에는 인색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서원 을 발하지 않았다. 문체는 아름답고 빼어났으며, 또한 전서와 예서로 정교하고 각기 오묘함에 이르렀다. 모여든 많은 제자가 글을 읽고 유교와 불교를 분별하여 능히 말했다. 전해오는 유·불의 경전을 들락거리며 비 록 유학에 머무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에 지나치진 않았다. 그가 지은 시는 슬프면서고 굳세고 호쾌하면서도 밝았고 탁한 채식(菜食) 기가 없었다.
이에 행적을 모으니 산을 억누르고 선종의 달이 올라 어두움에서 깨치니 이른바 욕망에서 벗어났다. 이에 음률을 풀어놓았는가? 무릇 관동의 물과 돌은 옥처럼 맑고 기괴하고 수려한 절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이다. 선사께서 항상 이곳에 주석하시니 밤 숲과 새벽이 골짜기에 은하가 쉬이 선회한다. 안개 덮인 기운이 머무르니 늘어선 촛불이 고요함을 밝힌다. 무릎을 잡고 앉아 시문을 길게 읊조리다 탄지경(아주 짧은 시간) 에 노랫소리 높이니 모두가 생긴 그대로 시가 되고 진실한 게송(偈頌)이로다. 더욱이 반야경을 기쁘게 외니 이곳은 묘음(妙音)이 스스로 머무는 자리요 법의 바다가 있는 곳이다. 선사께서 능히 이곳을 수용하여 밀인 (密印)을 돌리니 많은 중생이 응하였다.
범한 마음이 있어 살펴본들 어찌 헤아리랴 하물며 이 명주사의 주산을 만월산이라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나는 왕사성의 밝은 달빛이 흘러 이 산을 비추는 것을 안다. 영롱한 광채와 맑은 물이 높고 밝은 땅에 흘러 한 도량을 열었으니 선사가 그곳에서 반야(참 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를 성취하였다. 달같이 원만한 선사의 명성은 약사 여래가 계신 동방만월세계에 오래도록 있을 것인데 어찌 바르지 않겠는가. 선사께서 정축(1817) 년에 태어나 금년에 67세이며 승랍 50년이다. 고족 제자 오진(旿珍)과 제자들에게 그의 법을 거듭 전하여 피 안으로 건널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취연, 취현, 취운이 항상 법을 계승하였다.
비석에서 말하길 석가모니께서 영축산에서 화엄경을 설법할 때 모든 산에 비유하여 처음에는 높고 가파르 나 도를 따르면 결국은 더욱 가지런하여진다고 가르쳤다. 산문을 연 시조인 임제, 조동, 운문, 하택도 이와 같았다. 어떤 경우에는 높이 솟은 산, 혹은 산 구릉, 어떤 것은 첩첩이 깊은 산, 어떤 것은 포개진 산으로 일 정 구역에서 빼어남을 다투다 뒤를 잇는 세대가 따라와 미치니 석문, 고봉, 모암, 자백, 등 많은 인물이 나와 (고)자 무리, (나)자 무리, 은자 무리, (궁)자 문중 등 숲처럼 빽빽했다. 높고 뾰족한 산봉우리가 너른 들에 막 힌 것과 같으니 대동(우리나라)의 고개에서 신라국의 성(姓)씨가 스스로 창시되어 법식이 청허당(西山大師 休靜)에 이르러 우뚝 솟아 태화산처럼 단단하다.
공덕이 알려져 대대로 일어나니 산의 모양이 높고, 꼭대기에 돌이 많아 수를 셀만큼 또렷하다. 아∼불문에 서 운이 쇠하여 존중의 날들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묻히고, 막히는 구나. 아∼큰 산도 늙으니 두려움이 멈추 고 동배(同輩)가 된다. 티끌 하나까지 부여잡고 법을 강의하니 원만하고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밝은 들판(깨 달음)을 볼 수 있었다. 누가 상승(가장 뛰어난 교법)의 표묘(끝 없이 멀어서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음)는 이루 기 어렵다고 말했는가. 나의 채찍과 나의 신발은 앞서간 사람의 용맹함을 따라잡았다.
시가를 모아서 살펴보고 공부를 겸하여 불교에 입문하니 가파른 절경과 그윽한 골짜기의 기암은 옥빛 맑 은 우물의 연꽃 봉오리 같다. 안탕산(중국 제일의 명산)의 돌은 문드러진 공화(번뇌)요 푸르른(蒼然) 것은 고 색(古色)이요. 금강산 골짜기가 오대산에 막히니 연못에 달이 뜨고 속세에서 나오는 구름에 가려진다. 선사 가 그곳에서 마치고 쇠하여 귀의(南無)하였다. 안개와 노을에 원숭이와 학이 길게 대오를 갖추고 늘어서 있다. 광서 구년 계미(1883, 고종 20년) 칠월 일 세우다.88)

〈그림 24〉용악당대선사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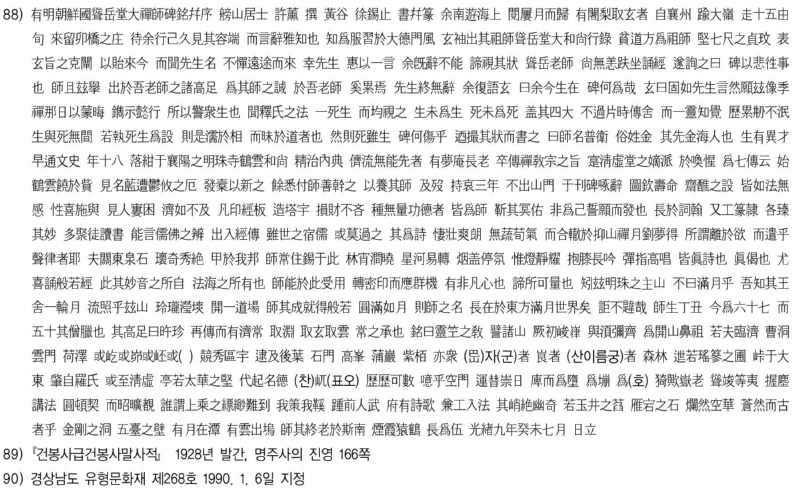
-
- 이전글
- 다) 학운당태선사정원(鶴雲堂太禪師正原)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 25.01.23
-
- 다음글
- 5. 명주사의 진영각(眞影閣)
- 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