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양양 3·1만세 운동의 전개(展開) (2)
페이지 정보
본문
3) 4월 5일 상황
양양 3·1만세 운동 이틀째 날로, 양양면·손양면·강현면·도천면, 4개 면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손양면은 월리, 양양면은 양양장터, 강현면은 물치장터, 도천면은 대포주재소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하였다.
가) 강현면(降峴面)·도천면(道川面)
강현면·도천면이 처음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유림과 물치감리 교인, 쌍천서숙 졸업생 그리고 마을 구장이 주도하여 물치장터와 대포주재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오전에는 강현면은 면사무소와 물치장터, 도천면은 대포주재소에서 각각 면별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후, 오후에는 강현면·도천면이 합세하여 양양독립 만세운동을 하였다.
▷ 강현면(降峴面)
1914년 일제는 통치 수단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당시 강선면과 사현면을 강현면으로 통합했고 면 사무소는 장산리에 두었다.
강현면은 장세환, 김두영, 김원식을 책임자로 정하고 각 마을 구장과 함께 해 나갔다. 또한 물치 감리교회는 교회대로 물치장 터에 만세 군중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룡리 구장 박봉래, 물치리 구장김두영과 박제범, 김대선, 강선리 구장 전달원과 윤순범, 이종엽, 중복리 구장 김창렬과 심한준, 하복리 구장 이철우와 이형우, 간곡리 구장 추병원은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손으로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장산리 양익환, 침교리 김원식과 김진선, 사교리 구장 김철기와 김환기, 주청리 구장 김경도, 적은리 장세환은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마을 구장은 자기 마을에서 한 집에서 한 사람 이상 주민을 동원하였다. 이날은 물치장 날이었다. 당시 대포항은 교통의 중심으로 대포의 이웃 마을인 물치리는 자연히 상업의 중심지로 물치장은 번성했다.
이날 옛 사현면 주민들은 물치장터로 오다가 장산리에 있는 강현면사무소에서“대한독립만세”를 땅이 꺼져라 외쳤다. 그러자 겁에 질린 면장과 직원들은 모두 도망가고 서기 김남훈(金南薰)만 남아있다가 만세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만세 군중을 구장이 선두에서 지휘하여 물치장터로 행진했다. 강선리 감리 교인인 김두영·전달원이 교회의 조직망을 통해서 아침 일찍부터 감리교인 약 60여 명 데리고 물치장 터로 모여들었다. 또 강현면의 북부지역 마을 주민들도 물치장터로 모여 들었다.
강현면에서 집결한 500여 명의 군중은 저마다 소형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약속된 장소인 물치장터 쌀가게 앞에 모였다. 옥양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는 각 마을 군중 선두에서 펄럭였다. 대형태극기는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웠다. 하늘과 땅과 세계 만국에 알리려고 아주 높게 세웠다. 동해의 바닷바람과 설악산 바람에 태극기는 힘차게 휘날렸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소리를 군중은 침묵하며 새겨들었다.
공약삼장을 낭독할 때는 군중도 큰 소리로 따라 했다. 낭독이 끝나자 지도자의 “대한독립만세” 선창에 따라 설악산이 울리도록 외쳤다. 삼창이 끝나고도 독립을 맞이한 것처럼 “대한독립만세”을 연이어 부르고 불렀다.
물치마을 앞 동해의 거센 파도가 몽돌을 굴리는 소리는 분노한 군중의“대한독립만세”에 화답하는 뜻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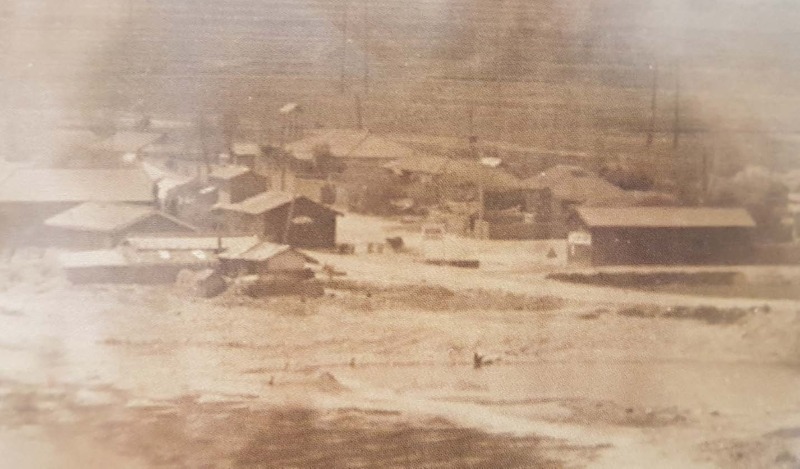
옛 강현면 물치리 모습
“동군(同郡) 강현면(降峴面) 시장(市場)에 폭민(暴民) 약(約) 오백(五百)집합(集合) 점차(漸次) 증가(增加)의 형세(形勢)이다. 금야(今夜) 대포(大浦) 또는 읍내(邑內)를 습(襲)할 계획(計劃) 있음에 엄중(嚴重) 경계(警戒) 중(中)”
물치장터의 만세운동에는 물치리의 계획을 담당하던 김두영(金斗榮)과 박제범(朴劑範), 김대선(金大先)의 활동이 컸는데, 김두영은 원래 도천면 대포리 사람으로 대포주재소가 설치되면서 집을 빼앗긴 후 물치리로 이사하여 살았으니 일본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그리고 김대선과 박제범은 나이 어린 감리교인 이었다. 이렇게 장세환을 대표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대형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오후에는 그 기세를 이어서 물치장터에 운집한 강현면 만세 군중 500여 명은 장세환과 김원식의 지휘하에 구장이 선두에 서고, 또 도천면(현 속초시) 중도문리 김영경, 부월리 이종순, 대포리 박사집이 인솔하여 물치장 터로 모여든 도천면 일부 군중들과 합세하여 도천면의 집결지인 대포주재소로 행진했다.
▷ 도천면(道川面)
1914년 4월 1일 일제가 양양군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을 합병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중도문리 이재훈과 이종국은 집에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여 주민들의 앞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인근의 대포주재소까지 행진하였다. 중도문리 김영경, 부월리 이종순, 대포리 박사집의 활약으로 많은 군중이 대포주재소 앞에 모였다.
이렇게 도천면 군중이 약속된 대포주재소에 집결하여“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을 때, 강현면 만세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봉래의 선창으로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왔다. 또 이철우도 물치장터에서 대형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독립선언식에 참석 했던 군중보다 많이 모인 군중에게 소형 태극기를 손에 들려 대포주재소로 행진하여 도천면민과 합세하였다.
전날(4일) 양양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일경의 사전 대비책도 그들 나름대로는 철저하였다. 일경의 가족과 일본인은 모두 대포항의 배에 태워 바다로 피신시켰다. 물치장 터에 모인 군중은 오전에는 5백여 명 정도였는데, 오후에 도천면민과 함께 대포주재소에 합세하였을 때는 점점 증가하여 만세 군중이 1000여 명이 훨씬 넘었다.
이에 도천면 만세운동 군중은 강현면 군중과 함께 대포리 일경 주재소 앞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은 물러가라!”“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니 일본인들이 금방이라도 쫓겨가면 독립이 될 것으로 기세가 높아지게 되었다. 겁을 먹은 주재소장이 직접 나와 군중에게 허리를 굽혀 빌었다.
일경이 물러가겠다는 설명을 듣고, 날이 저물도록 천여 명의 군중은 내일(6일) 양양에 가서 독립 만세운동을 할 것을 약속하고 해산하였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무력이 없는 평화적인 만세운동으로 일경의 굴복과 사죄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쳤다.

당시 대포 주재소 터
나) 양양면(襄陽面)
양양면은 양양장터에서 읍내 주민들이 어제와 같이“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
다) 손양면(巽陽面)
손양면은 왕도리 구장이던 김종택이 주도한 왕도리 주민과 삽존리(현재 남양리) 구장 김주황, 주리 구장 최한두, 우암리 구장 김진열이 앞장서서 손양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양양장터로 행진하였다.
이날 왕도리는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갔지만, 이웃 마을인 주리, 우암리, 삽존리 주민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를 들고, 뒤에는 백씨 노인이 태평소를 불고 징과 꽹과리 등으로 농악을 울리며 행진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흥겹고 축제 같은 평화적인 행진이었다. 고송 고개를 넘을 때는 간리 주민, 옛 동면 주민도 합세했다.
그러나 만세 군중은 월리 남대천 목교(木橋) 앞에 이르러 일경의 제지로 집결 장소인 양양장터까지 못 가고 멈추어야 했다. 남대천에서 완강히 제지하는 일경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남대천 건너 양양읍 내에서 만세 소리가 들렸다. 일경과 대치하고 있던 손양면 300여 명의 만세 군중은 그 자리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내일(6일) 양양읍 내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돌아섰다.
이 상황을 알리는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4월 6일 오전 7시 50분
“오일(五日) 양양군(襄陽郡) 양양면(襄陽面)에서 양반(兩班)을 중심(中心)으로 한 군중(群衆) 삼백명(三百名), 태극기를 세우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 읍내(邑內)를 통과(通過)하려 함으로 진무(鎭撫) 해산(解散)시키다.”
이렇게 양양 만세운동의 이틀째인 5일은 평화적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4) 4월 6일 상황
양양 3·1만세 운동 사흘째 되는 날로 양양면·손양면·서면·강현면·도천면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날 만세운동은 세 곳에서 전개되었다.
서면의 농민들이 4일 경찰서 앞에서 일경의 총탄에 숨진 김학구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일제에 반항 한 장례 만세운동이었다.
양양읍 내에서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의 군중이 만세운동을 하였고, 양양경찰서 뒤 언덕에올라가서 양양보통학교 4학년 학생이 만세를 불렀다. 어린이도 스스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가) 서면(西面)
이날은 독자적으로 일으킨 김학구의 장례 만세운동이었다. 김학구(金學九)는 원래 강현면 침교리 사람이었는데, 서면 상평리 권성심(權聖心)에게 데릴사위로 와 처가살이하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용감한 청년이었는데 양양 장날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경이 발포한 총탄에 경찰서 마당에서 숨졌다. 유혈이 낭자한 시신을 경찰서 뒷마당에 옮겨놓자, 서면 책임자 노용수가“끌고 가자”라고 소리치자이형우가 업어 자기 집 뒷마루 밑에 멍석으로 덮어 안치했다가 다음 날 가족이 찾아가 장례를 지내며 나타난 특수한 만세운동으로, 나라를 잃은 민족의 눈물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건이었다.
서면 상평리의 주민은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농사철이 한창 바쁜 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만세를 열심히 부르면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마을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했다. 김학구의 장례식은 3일 장으로 치렀는데 통곡의 행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서면사무소까지 갔으나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격분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먼저와 만세를부르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자 면장과 직원들은 도망쳐 버렸다. 서면 조개리 지석화(池石化)는 만세를부르는 군중이 먹을 음식 100여 명분을 준비하여 구룡령 너머에서 상평리로 운반하여 합세하려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마을 주민들은“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상여를 멘 사람들은 상엿소리로 원통한 영혼을 위로하다가 “대한독립만세”를 또 부르며 울부짖었다. 김학구(金學九)의 상여가 상평리 면사무소를 떠나 산길을 따라 30여 리 되는 그의 고향 침교리로 가던 중 강현면 물갑리 고개에 이르렀을 때 강현면 침교리에서도 상여를 꾸며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관(棺)이 서면의 상여에서 강현면의 상여로 옮겨질 때, 마침 양양장터로 가던 강현면과 도천면의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함께 통곡하니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후일 중도문리 이종인의 증언에 의하면“어느 동기간이 죽은들 그렇게 눈물이 나겠습니까? 라며 눈시울을 적시며, 침교리에서 장례를 지냈으나 일경은 산림법을 위반하여 묘를 썼다고 하여 다시 파내어 공동묘지로 옮겼다”고 한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7일 면사무소를 파괴하는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나) 손양면·강현면·도천면·양양장터와 양양보통학교 졸업반
▷ 손양면(巽陽面)
어제(5일) 양양읍 내로 와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비대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양양으로 가는 도중에 일경의 제 지를 받았으나 물리치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행렬의 선두에는 대형 태극기 밑에‘조 선독립’이라고 쓴 깃발과 함께 '대한독립지기(大韓獨立之旗)'라고 쓴 깃발을 세웠으며, 주리 마을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를 들고 농악대까지 그 뒤를 따랐다.
고송 고개를 넘을 때 그곳 주민들도 합세하여 남대천 나무다리를 건너 동운교 앞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일경에게 저지당했다.
이렇게 수비대와 대치하며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연창리 대미소 앞에서 강현면, 도천면 면민이 모여 있다는 전갈을 받고, 만세 군중은 용기를 내어 수비대의 저지선을 돌파하며 무사히 집결지 양양장터로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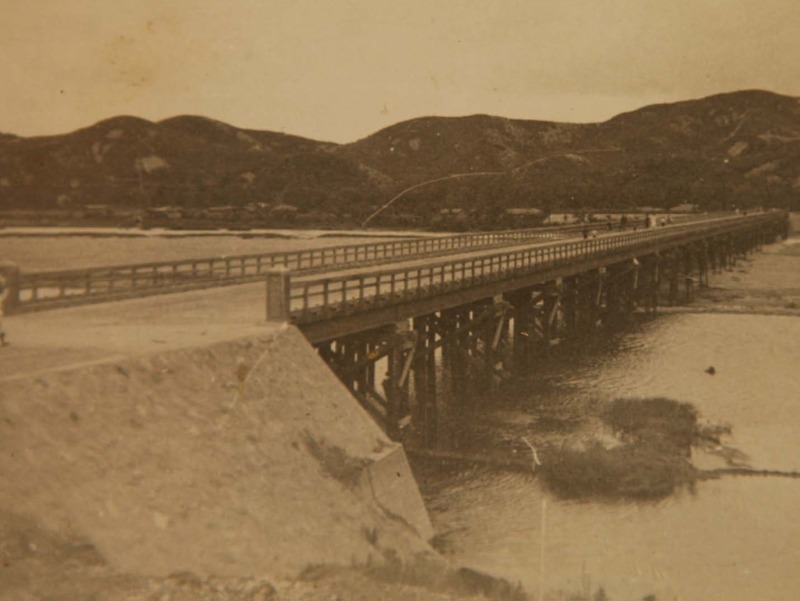
옛 남대천 목교
▷ 강현면·도천면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들이 5일 물치장 터와 대포주재소에서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마치고 약속대로 6일은 양양에 와서 만세를 부르려고 장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베 주머니에 주먹밥을 싸서 망태에집어넣고 15km 이상을 걸어서 양양까지 왔다.
이날도 이재훈·김영경·이국범·장세환·김원식·김두영 등 강현면·도천면 주도자들이 앞장서서 양양읍내로 진출하였다. 800여 명 정도가 되는 군중이 다시 모여 만세운동을 펼치기 위해 양양장터로 향했다. 읍내로 향하는 만세 군중 대열이 양양면을 통과할 때, 양양면 조산리, 사천리, 청곡리 등의 주민이 합세하여 군중은 점점 늘었다. 어제 대포항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미 배를 타고 피신해 있는 것을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기충천했다. 어떤 이는 독립이 된 줄 알고 양양에 가서 일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하여 나갔다. 이날 만세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니 정말 독립이 되겠지 하는 믿음이 생겼다. 물론 마을책임자의 격려로 농사일과 바다의 고기잡이를 모두 미루고 양양으로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한 것이다.
일경들은 만세 군중들에게“우리는 돌아갈 것이니 조용히 만세만 불러라.”고 간청하는 말을 믿었기에 독립을 눈앞에 둔 것 같은 흥겨운 기세가 아주 높았다.
그러나 당시 양양면의 사정은 달랐다. 양양읍 내 진입 통로인 동쪽 연창리 대미소에 일경과 수비대는 새끼줄로 길을 가로질러놓고 일반인의 통과를 막고 있었다.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 군중 특히 장세환, 김원식 등이 이끄는 강현면 군중들이 조산리를 지나 연창리 대미소 부근 수비대 앞에 당도했다. 당국에서 증원된 일본 헌병들에 의하여 연창리에서 저지당하게 되었다. 이때, 주동자 장세환은 선두에 섰던 6명의 시위대와 함께 무자비한 구타와 폭력을 당하여 물러나 군경과 대치하다가 손양면민이 동운교에 모여 있다는 전갈을 받았다. 수비대 군경의 포진(鋪陳)에도 불구하고 군중 900여 명은 새끼 줄을 끊어버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일시에 집결지인 양양장터로 들어갔다.
▷ 당시 김종극 선생의 수기
당시 14세였던 김종극(전 양양군초대문화원장)이 강현면 중복리에서 동네 어른들을 따라서 물치장터에 운집한 만세운동 군중들과 함께 양양읍 내 연창리까지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던 상황과 만세운동 후 주동자(김창열)가 연행되기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일기 형식으로 기술한 『풍상구십평생행적소회록(風霜九十平生行績所懷錄)』의 내용을 소개한다.
『1919년 4월 6일 己未年(기미년)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大衆(대중)을 따라갔다. 동리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러 간다기에 無酌定(무작정)으로 따라갔다. 물치리에서 태극기를 얻어 들고 萬歲陳列(만세진열)에 들어가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만세를 부르며 따라갔다. 四列縱隊(사렬종대)로 列(열)을 지어 만세를 부르며 進軍(진군)하였다.
선두에서는 큰 깃발을 나부끼며 만세를 열창하면서 連昌里(연창리) 대미 沼(소) 밑에 다다르니 憲兵五名(헌병5명)이 銃(총)에 칼을 꽂고 守備(수비)하며 길 中間(중간)에 出入禁止線(출입금지선)인 沮止線(저지선) 그어 놓고 萬若(만약) 이 線(선)을 넘어오면 發砲(발포) 한다고 겁을 주며 暴力(폭력)을 가하자 군중들이 解散(해산)되고 말았다.
萬歲 後(만세 후) 檢擧逮捕(검거체포)하기 始作(시작)하였다. 우리 洞里(동리)에도 巡査(순사) 2名과 守備隊(수비대) 1名이 와서 金昌烈(김창렬) 氏를 逮捕連行(체포연행)하는 것을 보고 驚愕(경악)하였다. 그때 그 동생이 質問(질문)하니 장작 개피를 들어 毆打(구타) 한다. 나는 恐怖(공포) 끝에 집으로 逃亡(도망)하였다. 日本植民地政策(일본식민지정책)이 苛酷(가혹)함을 맛보았다. 金昌烈(김창열)氏는 萬歲運動(만세운동) 主動者(주동자)로 逮捕(체포)되어 二年間(2년간) 咸興監獄(함흥감옥) 살이를 하였다.』
▷ 양양장터
이와 같이 양양면, 손양면·강현면·도천면의 군중은 집결지인 양양장터에 모두 모였다. 먼저 양양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던 양양면 군중 400여 명, 손양면 군중 300여 명, 강현면과 도천면 800여 명이 합세한 군중의 기세는 의기양양했다.
이때 상황에 대해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군(襄陽郡) 대포(大浦) 습(襲)하여 한 팔백명(八百名)의 군중(群衆) 작육일(昨六日)에 천이(千二), 삼백명(三百名)에 달하여 읍내(邑內)를 습(襲)하려 하였으나 병력(兵力)을 공(恐)하여 폭행(暴行)을 불위(不爲) 주모자(主謀者) 칠명(七名)을 인치(引致)함에 차(此)에 인치건(引致件)을 경찰서장에게 청원(請援)하였음으로 간유(懇諭)하여 퇴산(退散)케하다. 상 동군 현북, 현남의 양반민심 동요 불온(不穩)의 조(兆)가 있음”
이렇게 장터에 모인 1500여 명의 군중은 선두의 선창에 따라“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잠시나마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만세 군중은“일본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찰서 주변으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이재훈과 김원식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군중의 대표로서 서장과 군수에게 “양양에서 떠나라”라고 요구했다. 일경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취하며 군중의 대표와 군중에 대하여“자기들 일본 사람은 돌아갈 테니 군중도 돌아가라”라고 군중에게 허리를 굽혀 간유(懇諭)하면서 빌었다. 석양이붉게 빛날 때, 일경이 물러가겠다는 회유의 설명을 듣고 만세 군중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 양양보통학교(襄陽普通學校) 졸업반 학생의 참여
이날 양양보통학교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날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 군중이 양양면에서 만세운동을 할 때 경찰서 뒤 군행리 언덕에서 양양보통학교 제4학년 학생인 김억준(金億俊)·이창식(李昌植)이 주동하고, 약 10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이 사건으로 김억준은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까지 끌려갔다가 나이가 어려서 풀려 나왔다.
그 후에 일경(日警)은 시위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양양면에서 옥고를 치른 복역자는 17명이었다. 그 명단은 최인식(崔寅植)·김재구(金在龜)·김필선(金弼善)·김주열(金周烈)·김봉운(金鳳運)·이관진(李寬鎭)·이원도(李源燾)·이원희(李源熙)·김주호(金周鎬)·김규용(金圭容)·김계호(金啓鎬)·최영덕(崔永德)·김종태(金鍾台)·김명기(金明基)·최항식(崔亢植)·최영원(崔永原)·김봉도(金鳳道·이경근(李敬根) 등이다.
양양면 강산여·김암이·문달문·홍대갑·이상온은 2개월 자유형으로 60대의 태형을 받았다. 또 박왕근·박재룡·박태석·방덕홍·성광호·박성문·우길록은 3개월 자유형으로 90대의 태형을 받았다.
또한 이두형·김두선·안광수도 태형을 받았다.
4월 5, 6일 양일간의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도 많았지만 잡혀가 태형을 받은 이는 더욱 많았다. 시위 후에 도망한다고 해도 경찰이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또 못자리 설치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옥고(獄苦)를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함흥지방법원이나 강릉지청의 판결문이 현재 없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한 사람의 것도 일부만 남아 있으며, 일제시대에는 옥고를 치른 것을 스스로 감춰야 일제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손양면에서는 독립 만세운동을 주동한 김진열(金振烈)·최한두(崔漢斗)·김종택(金鍾澤)·신세묵·이국범 등은 붙잡혀 원산 감옥에서 1년 옥살이를 했고, 주리 장두용(張斗容)은 태형을 받았다. 강현면에서는 물치리의 김두영(金斗榮)·박제범(朴濟範)·김대선(金大先)·김대광(金大光) 강선리의전달원(全達元)·윤순범(尹順範)·이종엽(李鍾燁), 하복리의 이철우(李喆雨)·이형우(李炯雨)·이능우(李能雨), 중복리의 김창열(金昌烈)·심한준(沈漢俊), 사교리의 김철기(金鐵起)·김환기(金桓起), 침교리의 김원식(金元植·김진선(金振璇)·김태선(金泰善) 등과 간곡리의 추병원(秋秉元), 장산리의 양익환(梁益煥), 회룡리의 박봉래(朴鳳來), 적은리의 장세환(張世煥), 주청리의 김경도(金敬道) 등과 윤형집 (尹亨集)·김승식(金昇式)·박순범(朴淳範)·박관홍(朴寬弘)등이 옥고를 치렀다.
이 중에서 박제범과 김대선은 미성년자로 함흥 유치감(幼稚監)에서 옥고를 치렀다. 또한 도천면에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은 도문리의 이석범·이재훈(李載勳, 능렬)·이종국(李鍾國)·이춘재(李春載), 김영경(金英經)·김정식(金鼎式)·이동열(李東烈) 등과 부월리의 이종범,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 등이었다.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인·이정렬·이재환(李載煥) 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의 자유형)의태형을 받았다. 김사만도 강현면(降峴面)에서 만세 시위를 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태형 180대를 나누어 맞는 일도 있었다.
양양 3·1만세 운동에 직접 참가한 김철기(金鐵起)가 해방되고 첫 번째 3·1절 기념식 행사장(1946년 3월 1일)에 참가하여, 그날을 회상하며 순국한 독립운동가를‘마음 터놓고 추도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라는 추도(追悼)한 한시(漢詩)를 소개한다.
▷ 추도시(追悼詩)
桓疆舊域建新機 (환강구역건신기) 환단의 옛 강역에 새로운 기틀을 세우려
旣着念頭時不違 (기착염두시불위) 생각은 때를 어기지 않고 이미 착수했네.
陷死後生今日是 (함사후생금일시) 죽음에 빠졌던 후생들이 오늘을 시인하며
要譽先毁去年非 (요예선훼거년비) 명예를 얻고자 헐뜯던 지난해를 비난하네.
看吾白髮愁何在 (간오백발수하재) 우리가 보는 백발의 수심 어디에 있나
挽彼黃河運復歸 (만피황하운복귀) 저 만장은 황하에서 복귀하는 운수로다.
中途幾人含怨逝 (중도기인함원서) 중도에 몇 사람이나 원한을 품고 가셨나
表衷追悼淚霑衣 (표충추도루점의) 마음 터놓고 추도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
- 이전글
- 다. 양양 3·1만세 운동의 전개(展開) (1)
- 24.03.11
-
- 다음글
- 다. 양양 3·1만세 운동의 전개(展開) (3)
- 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