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정기(遊鳳頂記)
페이지 정보
본문
▪ 유봉정기(遊鳳頂記)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내가 금강산에서 영시암으로 돌아왔다. 둘째 아들 치가 한양에서 인사하러 들렸다. 윤화숙 또한 함께 와서 묵었다. 조석으로 우거진 정자와 훤한 누대 사이에서 노닐며 단풍의 엷고 깊음을 평하고 봉정의 감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모두 감흥이 올라 억제할 수 없었다. 치과 화숙이 만나서 처음 이 곳에 도착하였다.
이런 때를 자주 얻기가 어렵고 이번 기회는 놓핑 수 없다고 여기고, 또한 달은 밝아지고 단풍은 더욱 붉어져 유람을 가고 싶어 하였으나 나는 누적으로 쉬고자 하여 도무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에 음력 9월 초파일에 두 사람이 계속 신발을 수선하였다. 심원사의 스님 석한을 길을 안내하고 노비 두발이 옷과 이불을 꾸려 따랐다. 이때 장맛비는 갤 여지가 없고 강한 바람과 불그스름한 구름이 마치 눈을 뿌릴 듯하여 함께 가기가 주저되어 기회를 미루고자 하였다. 내가 찬성하여 그들을 따르기로 했다.
동쪽으로 계곡을 건너 숲을 뚫고 가다가 중간에 이른바 표묘등을 올랐다. 몇 리를 가서 운모담에 이르렀다. 돌이 적고 여울은 맑아 가히 마시며 놀 만하였다. 그곳은 운모석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름 지었다. 이곳을 지나 또 깊은 숲을 뚫고 귀담에 이르렀다. 수석은 그다지 특이하게 빼어나지 않지만 이끼 낀 절별과 구름이 낀 소나무에 자못 그윽한 풍취가 넉넉하다. 멀리 봉우리 또한 눈여겨 볼만한 것이 있다. 더욱 흥을 끌게 한다. 얼마 안 되어 유홍굴이다. 단지 좁아서 서너 명이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예부터 전해지기를 유홍이 강원도 관찰사로서 산을 찾았다가 이곳에서 유숙했었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계곡의 두 길이 굴 옆에서 만나는데 남쪽은 12폭포로 향하고, 동쪽은 폐문암으로 향한다.
마침내 남쪽을 버리고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계곡물 속에 어지럽게 많은 돌들이 서로 쌓여있어 발을 딛기가 힘들었다. 좌우 아랫도리를 걷고 하면서 간 것이 대략 여러 리였다. 돌벼랑이 빙 둘러있어 마치 담을 설치해 놓은 것과 같다. 계곡물이 돌아 흐르면서 굽이마다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따라 들어가니 그윽하나 별도의 하나의 오솔길이 있어 또 몇 리를 갔다. 북으로 거대한 절벽이 높이 솟아 있어 하늘과 가로로 걸쳐 있는 것이 수 백보였다. 올려보니 아찔한 것이 넋을 흔든다. 계곡을 건너 남으로 가니 너럭바위 하나가 있어 걸터앉아 북쪽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성대한 기세가 더욱 기이하고 위대함을 알았다.
나는 그것을 곤륜이라 부르고자 하였다. 이에 넝쿨을 잡고 돌비탈길에 올라 돌아서니 걸을 때마다 모양을 바꾼다. 모두가 절벽을 바라보며 절경이라 한다. 계곡물이 절벽 밑을 돌면서 소용돌이쳐 소를 이루니 묘하게도 산이 솟아있는 운치가 있다. 좋은 곳을 택하여 대를 쌓고 영원히 세상을 떠나 은둔하고 싶었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또 돌무더기와 잡초더미까지 지나 5리쯤 가서 폐문암에 도착했다. 양쪽 벼랑이 하늘을 치받히고 솟아있어 실로 대적하기 힘든 적수가 되었다.
대게 한 번 기세로 녹아서 이루어져 막혀서 엉킨 것이 아니다. 굳건한 돌 부채 모양이고, 둥근 것이 안장 모양이다. 또 교체로 계단 모양이다. 여울과 못이 서로 이어져 위 못의 잔물결은 무늬 있는 비단 같고, 아래 두 못은 빛나는 상자 같다. 대저 시원스러운 것이 견줄 바가 없다. 못은 동서로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가히 걸터앉아 읊조리고 바라볼 만하다. 구름이 양쪽 벼랑 사이에서 나와 유유히 떠가고, 옥 같은 가파른 산과 비단 같은 나무들이 풍경을 돕는다. 황홀하게도
단구에 신선이 있네 라는 정취가 있었다. 내가 따라오면서 처음에 유홍굴로 한정하였다. 아득히 먼 길을 오면서 그 피로를 아직 못 느끼고 여기에 이르러 흥이 더욱 짙어진다. 특별히 흥을 거두어 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스스로 다리 힘을 헤아려보니 또한 전진할 수 있을 만하여, 드디어 함께 봉정암까지 가기로 결심하였다. 늙은이가 이곳에 와서 흥취가 다시 얕지 않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이 실로 먼저 이 같은 것을 얻었도다.
문으로 들어서서 비스듬히 좌측으로 길을 가니 더욱 길이 막힌다. 근래 큰 비가 온 후 계곡 길이 뒤집혀 바뀌고 나무가 뽑히고 비탈길이 무너지고 길을 바꿀 수도 없었다. 대게 바르지 못한 나무 사이로 서리 맞은 낙엽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더욱 넘어지기가 쉬었다. 걸음마다 마음조리며 지나가니 북쪽에 작은 폭포가 있었다. 높이는 십여 장쯤이 되고 흰 돌들로 이어져서 쌓여있으니 피로를 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구경거리였다. 맞은 편 고개에 긴 폭포가 있는데 여러 층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그다지 눈에 보기 좋지 않았지만 그 양쪽 폭포들이 마주보고 흘러내리는 것은 기록할 만하였다.
5리를 가서 빙호동 입구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 큰 계곡을 버리고 남쪽은 곧 바로 봉정암으로 가는 길이다. 바위 사이에서 불을 때서 밥 먹는 곳을 만들었다. 산보하여 골짜기로 들어가니 골짜기는 수백 보였다. 자갈이 어지럽게 쌓여있지 않고, 하나의 돌로 골짜기를 다하고 흰 여울이 가로로 둘러있어 첩첩이 흥을 일으키니 하마터면 돌아옴을 잊을 뻔 하였다. 계곡 남쪽에 작은 굴이 있는데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묶는 곳이다. 손작의 태산부에서 소위 “그윽한 바위에서 생각을 엉키고, 긴 내에서 맑게 읊는다.”라고 한 것은 오직 이 곳만이 그것에 합당하다.
식사 후 오솔길을 따라 남쪽으로 갔다. 처음엔 매우 침침하여 찾을 수 없었는데 왕왕 중들이 돌을 쌓아 표식을 해두어 찾아 갈 수가 있었다. 노송나무가 엄중하게 우거진 속에 작은 시내가 폭포를 이루어 여러 번 그 옆에서 쉬었다. 북으로 여러 봉우리들을 바라보니 하얀 것이 마치 현포에 쌓인 옥처럼 밝게 빛나 시선을 빼앗았다. 형언할 수가 없었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니 봉우리가 교체로 드러내는 기이한 모습들은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다. 바야흐로 손가락으로 가리킬 겨를도 없이 앞에 솟아오르니 또한 무한한 안식의 땅이다.
작년 가을 유람 왔을 때 스님 두가 실제 이곳을 따라 왔다. 그래서 눈을 들어 여러 고개를 보며 그 중 한 빼어나 그것을 가리키며 바로 이것이 봉정암이라고 하였다. 함께 유람 온 자들이 처음 온 자나 다시 온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내달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피곤하여 계속 할 수 없어 마침내 스님 두와 스님 석한으로 하여금 먼저 가서 밥을 짓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천천히 걸어서 따라갔다. 잠깐 곁눈질하는 사이에 미혹하게도 길을 잃었다. 계곡 길을 버리고 돌아 산등성마루에 오르니 잠깐 사이에 아주 큰 거리의 착오가 생겨 다만 앉아서 진실로 보지 못하고 흙을 들추며 그치지지 않았다. 이내 돌에 막혔다.
마침내 두발을 서너 번 크게 불렀으나 산이 울릴 뿐이었다. 우수수 소리 나며 숲이 움직이자 나무에 기대어 그침 없이 불렀다. 처음엔 마치 고개 중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 듯하더니 잠시 후에 스님 두와 스님 석한과 함께 내려왔다. 떠들썩하게 맞이하며 위로하길 다행이구나. 멀리 안가고 돌아왔으니, 모두 바위 밑에서 하룻밤 묵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도하여 대장암 아래에 이르렀다. 바위는 겹쳐진 돌이 질서 정연한 것이 자못 경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을 얻은 것이다. 대장암에서 서남쪽으로 바라보니 여러 가파른 봉우리들이 빽빽하게 벌여 있고 나는 듯 달리는 듯 쫓는 듯 읍하는 듯 여러 사물들이 모양을 바꾸는 것이 모두 보인다. 동으로는 맑은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아득히 하늘과 바다가 서로 접하였다. 수백 보를 오르고 올라 우러러 보니 천문이 느닷없이 열리고 한 스님이 구름을 헤치고 내려오니 비로소 봉정암이 가깝고 비어있지 않음을 알았다.
고달픔을 무릅쓰고 한번 내딛으니 여기가 탑대의 북쪽이다. 큰 바다가 눈네 가득하다. 여러 산들이 모두 다리 아래에 있는데 강한 바람이 사람에게 불어오는 것이 마치 나부끼게 하려는 것 같았다. 스님 옆에 서서 멀리 정북쪽의 안개와 눈 속에서 빛나는 것을 가리켜 금강산의 구경봉이라 하였다.
내가 막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날듯이 뛰었다. 이 대는 하나의 산의 높은 곳에 웅거하여 모든 힘이 된다. 동으로는 바다를 보고 북으로는 금강산을 당기고 모두가 품안의 물건이다. 그 훌륭한 경치를 논한다면 가히 뛰어나 견줄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대가 되는 것은 기울고 좁아 위태로운 것이 맘대로 거닐기에는 거리낌이 있어, 이것이 진실로 하나의 흠이었다. 또한 그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봉우리들의 난새가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 하여 다만 그 등을 어루만지고 오히려 안으로 장벽이 있어 큰 바다의 고래가 뛰고 봉새가 목욕하는 그 전모를 다 보지 못한다. 만약 다시 나아가서 청장으로 올라간다면 바야흐로 각기 다른 사물의 동일한 근본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위로는 하늘이 없고 아래로는 땅이 없다 할 만하니 그곳이 금강산의 비로봉과 동일한 위치일 것이다. 즉 이 대는 비로봉과 견준다면 조금 낮고, 정양사와 견준다면 보다 높다. 높고 낮고 통하고 막히는 그 사이에 감상에 맞고 마음에 상쾌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조물주의 갖춤이 묘유가 되든 우연히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완전함을 책하였으니 어찌 사람의 안목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가름하고 길게 읊조리고 벼랑을 따라 남쪽에는 우뚝한 탑이 있다. 이에 바위가 귀부가 되어서 무릇 3급이었다. 예부터 전하기를 화엄승 자장율사가 건립하였고 탑 북쪽 조금 평탄한 곳에 석가의 진골을 묻었다고 한다. 이 탑 남쪽 돌 틈이 마치 소 코를 꿴 것 같이 아주 옛날 배를 묶었던 곳이라고 한다. 그 설이 매우 황당하긴 해도 또한 멋대로 기록하기에 무방하다.
동쪽으로 수백 보 내려가니 암자이다. 등으로 여러 바위를 지고 의젓한 것이 마치 신이 지키는 것 같다. 한 봉우리가 특히 암자에 임하여 산이 마치 봉황이 부리를 드리운 것 같고 거의 무너질 듯 위험하였다. 암자가 이름을 얻은 것이 과연 이 때문이다. 집은 모두홀 이지만 밝고 깨끗하여 거처할 만하였다.
탑대에서 와서 몸에 바람과 이슬 기운이 가득하여 문을 닫고 아랫목으로 가서 앉아 찬 몸을 녹이니 역시 한번 머물만하다. 스님 두 명은 모두가 지식이 없었다. 한 스님이 조금 총명하여 능히 오대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는데 맑고 부드러워 들을 만하였다.
어두워지자 등불을 켜고 잠깐 범패를 부르더니 그쳤다. 문을 열고 초승달을 보니 서리와 같았다. 세 사람이 함께 탑대에 올라 오래도록 읊조리며 그 달빛이 매우 아름다운 것을 찬탄하였으나 오히려 산바람이 너무 센 것을 걱정하였다. 숲과 골짜기를 어지러이 휘어감아 마치 날리는 흉한 기운이 허공을 덮는 것이 있는 듯하니, 이것이 맑고 고요한 흥취를 감소시켰다. 작년 가을 이 대에 올랐을 때 때마침 보름달을 만났으나 오히려 밝고 맑은 것이 흠이었다. 전후를 합하여 통틀어 보니 흥취가 온전할 수 있었다.
걸음을 탑 북쪽으로 가니 은하수가 바다에 드리워진 것을 굽어보니 출렁거리는 것이 정하지 않아 서로 박수를 치며 돌아왔다. 처마를 쳐다보니 또다시 기이함에 소리를 질렀다. 곧 봉정암이 사람 머리에 임해 있었다. 평상을 빌려 밤을 지내는데 스님 한 분이 옆에서 가부좌를 틀었다. 베개 밑으로 자연의 소리가 불어오더니 파도가 들끓는 것처럼 소리가 난다. 처한 곳이 높아 몽상도 대개 인간 세계가 아니었다.
날이 밝아 재촉하여 밥을 먹고 봉정암 앞길을 택해 12폭포를 찾았다. 나는 일찍이 20년 전에 폭포를 찾아 이곳을 지나갔었으나 마치 떨어질 듯 아득하였다. 스님 석한 스스로도 한번 왔으나 가는 길이 매우 험하여 반드시 허공에 올라 줄을 붙잡고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봉정암 스님에게 줄을 빌렸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니 골짜기가 온통 잣나무 숲으로 둘러 있어 걸음마다 걸리고 막혔다. 잠깐 헛디디면 구덩이로 떨어져 골짜기에 묻힐 것이다. 형세가 그렇다. 약 5리를 가니 갑자기 절벽과 골짜기에 이르렀다. 스님 석한이 줄을 잡고 내려간다고 말한 곳이 여기었다.
폭포가 수백 척으로 걸려 있고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좌측은 모두 큰 절벽이고 형세가 마치 쇠를 절단한 것 같았다. 발을 붙일 만한 한 치의 흙도 없고 손으로 잡을만한 한 척의 나무도 없었다. 비록 줄이 있을지라도 장차 어찌 쓰겠는가. 스님 석한에게 마땅히 거쳐갈 곳이 아니라고 다투어 힐난하였다. 전일의 올라감이 오늘의 내려감보다 비교적 쉬었고 비가 온 후부터는 절벽이 더욱 심하게 가파르게 느껴졌다. 역시 어찌하겠는가. 돌아가 다시 폐문암 길을 찾느니만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동행들은 매우 깊숙한 곳에서 혼이 다 빠져서 폭포를 찾는 흥취에 실패하자 모두 낙담하며 길을 인도함에 자세히 살피지 못했음을 책망하였다.
스님 석한이 비로소 말하기를 어제 작은 길이 탑 밑으로 가로질러 있음을 보았습니다. 혹시 폭포로 가는 하나의 길을 찾을 듯도 하니 한번 찾아봄이 어떨지요라고 하니, 마침내 숲을 헤치고 비스듬히 서쪽으로 갔다. 하나의 산등성마루를 넘으니 길이 점점 나누어져 마치 연뿌리를 절단하여도 그 가운데에 있는 실은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았다. 길이 거의 끝나는 계곡길에 기쁘게도 돌로 된 표식을 만나 길을 헤매지 않고 갔다. 4·5리를 가서 비로소 계곡길에 이르니 물은 맑고 돌은 희어 갑자기 마음과 눈을 탁 트이고 밝아지게 하는데 12폭포가 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
계곡을 다라 가다 누차 아름다운 곳에 이르렀는데 못과 폭포가 서로 이어져서 모이고 흩어짐이 마치 수정이 병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최후의 폭포 하나는 더욱 기이하고 아름다웠다. 단풍 숲 사이에서 빛나는 것이 흰 명주와 주렴이 날리는 듯하였다.
하지만 아직 12폭포의 안은 아니었다. 여기를 지나가자 곧 시냇물이 좁은 곳으로 달려가 세차게 흐르고 친척의 높은 고개가 남쪽에서부터 치달아 서로 만났다. 이에 쌍폭이 함께 한 못으로 떨어진다. 동쪽에서 사람과 함께 오니 그 근원을 알 수가 있었다. 남쪽에서 나온 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하여 그 근원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높이를 헤아리면 동쪽은 짧고 남쪽은 길다. 짧은 것도 30장은 되고 긴 것은 100장쯤 된다. 남쪽 폭포 위로는 3층이 더해져 날아 흐를 때 아득하니 뿌옇고 자취빛 산과 가장자리가 없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는 그 형상을 궁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차차 비탈길을 따라 서족으로 포복하여 가니 못 옆에 이르렀다. 그 쌍폭의 형상을 자세히 보니 크게 수무지개와 암무지개가 지붕 없는 우물에서 함께 물을 마시고, 훨훨 날리는 것이 해오라기가 춤추고 용이 오르는 듯하니 서로 마주대하고 있으나 서로 부딪히지는 않았다. 마치 못이 좁은 것이 그 변화하는 모양을 수용하기엔 부족할까 물이 넓고 깊은 것이 백 칸이다. 바야흐로 그 수량을 칭찬하고 기이함을 기록한다.
넘쳐서 아래 못을 되자 넓은 것 또한 이와 같았다. 위는 정방형이고 아래는 직사각형으로 각각 하나의 형상인데 상하를 번갈아 보는 사이에 녹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묘하였다. 폭포가 이를 이었는데 높이가 10여 장은 되었다. 바람이 가랑비를 걷어내고, 아침놀에 번뜩이니 문득 비 갠 후의 무지개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못 가의 흰 돌은 희기가 마치 서리와 눈 같고 해송 몇 그루가 그 가에 그늘을 흩뜨려서 더욱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진다. 그것을 뛰어넘어 날아오를 길이 없음이 한이었다. 대게 내가 전후 합해서 3번 어울렸는데 지금 빼어난 경치는 그보다 배였다. 한번 비가 씻겨내니 하늘이 나를 받든다고 이를 만하였다.
아래 못이 넘쳐 또 떨어지는 폭포를 이루어 감실 같이 파인 곳을 어지러이 짓찧는데, 가운데가 나뉘어져서 두 줄기를 이루었다. 시내를 사이에 두고 그곳을 바라보니 보이는 바가 매우 기이하였다. 종종 표현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았다. 이것을 좇아 내려오니 귀와 눈에 달라붙는 것은 우레와 같은 소리요 눈처럼 흩날리는 물방울이니, 이 폭포가 아닌 것이 없었다. 이루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고 다만 이른바 12폭포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봉정암부터 쌍폭까지가 거의 20리이고, 쌍폭부터 또 15리 이후는 상수렴이다. 돌 표면이 밝고 매끄러우며 긴 폭포가 그 위에 걸쳐있고 둥근 못으로 이어지고 첩첩 고개로 둘러있으니 그 경치를 읊으면 중상에 놓일 만하다. 드디어 돌에 요를 깔고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남쪽을 바라보니 하나의 둘이 하늘을 치받치고 멀리 옥처럼 서있는데,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쌍폭의 꼭대기일 것이다. 조금 내려가다 또 아름다운 곳에 이르렀다. 흰 돌이 마치 옥 같은 눈과 같았고, 두루 꺾이어 병풍 모양을 이룬 것이 모두 7·8겹이었다. 깎이고 쪼개진 것이 교묘하고 치밀하였는데 못이 협소하고 언덕이 기운 것이 흠이어서 둘러보니깐 마음에 차지 않았다.
다시 5리를 가니 하수렴에 이르렀다. 이곳이 내가 제일로 마음에 드는 곳이다. 층첩으로 쌓인 높은 봉우리들이 좌우로 산세를 지고 솟아있다. 경계를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가운데는 골짜기를 열어 젖혔는데 넓고 확 트인 것이 깨끗하고 상쾌하였다. 상하 수백보로는 둥근 못, 넓은 폭포, 얕은 여울, 돌아드는 물굽이, 너럭바위, 우뚝 선 벼랑, 푹 들어간 굴, 평평한 뜰 등이 적적하게 배치되어 알맞은 자리를 얻어서 곡진하게 운치가 있었다. 골짜기 입구는 확 트여있고 한줄기 은빛 성이 가로로 걸쳐있으니 곧 고명재였다.
동쪽 벼랑에 평탄한 곳이다. 일찍이 조석과 더불어 돌을 베개 삼고 흐르는 물에 양치질 하며 마주하여 자면서 그곳을 회이대라고 이름을 짓고자 하였다. 대 서쪽에 작은 계곡물이 흐르고 칡덩굴이 덮여서 눈을 가렸었는데, 지금은 홀연히 큰 골짜기가 되었다. 하나의 천석의 기이함 위에 기이함을 더하고 실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마땅히 그 골짜기를 용개라 이름 지을 만하다. 수렴동 위로 하나의 흙 언덕을 차지하고 나무로 관옥을 삼아서 이 사이에서 은거하고자 하였다.
과연 이러한 계획을 이룬다면 영시암은 하나의 매미 허물이 될 것이다. 골짜기 입구에 조담이 있는데 돌길이 매우 비탈져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비로 인해 잔도가 깎여 별도로 언덕 위의 길을 취해 비스듬히 계속 가니 유홍굴에 다다랐고, 저물기 전에 영시암에 돌아왔다.
내가 이산의 주인이 된 후부터 무릇 백연의 원류와 크고 작은 설악의 고개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새장 안에 있는 것으로 지팡이와 신발로 뜻대로 할 수 있었다. 봉정암과 쌍폭에 이르면 곧 험준함 때문에 중도에 투숙하기가 어렵고 하루 만에 곧장 도달하기도 힘들었다.임신년 한 번의 탐승을 제외하고는 비로소 작년의 실천이 있게 되었으나 종적도 가히 성글었다 할 만하다. 대개 비록 고질병이 엄중할지라도 쇠한 나이로는 다리 힘을 아껴야 하니 이와 같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는 또 늙어서 생기는 병이 더해져서 함께 이른다. 다만 모름지기 빈 대에서 머리 들어 눈으로 돌아가는 구름을 전송할 뿐일 것이다. 옛사람이 이른바 몇 번이나 지나가볼 수 있을까 라고 하였으니 족히 개탄할 만하다. 나를 일으킬 이가 없었다면 그 누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리오.
나는 실로 해를 거듭 할수록 감상함은 행운이다. 또한 너희들 치겸과 윤화숙이 멀리 서울에서 와서 만나 모인 것을 생각하니, 이조차도 이미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네 계절 중에 가을을 만났고 또 중양절임이다. 일박하면서 밝은 달과 맑은 아침 해를 얻었다. 때마침 또 백년에 한번 온 비로 바위와 계곡이 크게 씻기었다. 큰비가 그쳐 못이 맑고 찬 서리에 단풍은 밝아 가지각색으로 눈을 비비게 하였고 가슴을 씻기었다. 양진·미경·상심·낙사가 어우르게 되었을 뿐 아니니 비록 말을 잊고자 하여도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본디 기록하는 것에 게으르다. 금강산을 다섯 번 유람하였고 이곳에서 6년을 살았으나 일찍이 한 번의 유람기도 지은 적이 없었다. 타인의 간섭을 받았으나 또한 억지로 할 수는 없었다. 지금은 곧 흥에 말미암아 구술하니, 아들 치가 하여금 붓을 잡고 베껴 가게 하여서 가지고 가 서울에 있는 여러 자식과 조카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늙어서도 산을 사랑함을 알게 하고자 하니, 이에 흥이 격렬해진다. 그리고 그 융치의 근원을 찾고 운람을 표현한 것과 같은 것들은 여행의 지침서로 삼아도 또한 가할 것이다. 신묘년 9월 중양일에 백연동 주인이 기록하다.
『三淵集』
遊鳳頂記 辛卯
余自金剛返策于永矢菴. 則致兒自京來省. 尹君和叔亦同來. 與留菴中. 晨夕徜徉於茂亭曠臺之間. 指點霜葉淺深. 談及鳳亭之賞. 皆不禁興情飛越. 盖致與和叔邂逅始到. 以爲時難驟得而機不可失. 亦欲趁月生明. 與楓益爛赤而振策. 余則積疲思息. 了無偕往之意矣. 乃季秋初八日. 兩人者聯翩理屐. 以深源僧釋閑爲嚮導. 奴斗發者襆被以從. 時宿雨未甚開霽. 勁風彤雲. 似有釀雪意. 同行趑趄欲退期. 余則贊决而隨之. 東渡澗穿穹林. 中緣所謂縹緲磴. 數里至雲母潭. 石淺瀨淸可嗽弄. 以其多産雲母故名之也. 過此又穿穹林至龜潭. 水石不甚殊絶. 而苔壁雲松. 頗饒幽意. 遠峰亦有赴矚者. 尤令興延. 無何爲兪泓窟. 只是淺广. 可受三四人避雨. 自昔傳兪泓以本道方伯. 探山歷宿于此. 故得名云. 溪水兩道. 會于窟側. 南則向十二瀑. 東則向閉門巖也. 遂捨南而趍東. 澗中多亂石交疊. 艱於投足. 左右揭蹋而行者約數里. 石崖環匝. 若設門屛. 溪水循焉. 曲成灣淥. 寅緣而入. 窈然別一蹊徑. 又進數里. 北有巨壁峻極. 霄漢橫亘可數百步. 仰之凜然動魄. 揭澗而南. 得一平巖. 踞而北望. 渾然磅礴之勢. 愈覺奇偉. 余欲名之曰昆侖. 於是捫蘿緣磴而轉. 隨步換形. 都以望壁爲勝. 溪水之縈于壁趾者湍洗潭停. 妙有泓崢之致. 擬欲擇勝而築㙜. 以永蔭映而姑未暇也. 又歷碨磊及菑榛. 凡行五里. 至閉門巖. 兩崖撑霄而起. 實爲勁敵. 盖一氣所鎔成. 非關湊泊. 堅爲石扇. 鋪爲盤陀. 又遞爲階級. 湍與潭相承. 上潭淪漣若織文. 下二潭如鏡發函. 大抵灑落寡仇. 潭東西有巨巖. 可踞而吟望. 雲出兩崖間. 冉冉徘徊. 瓊嶂錦樹. 助發光景. 怳乎有丹丘仍羽人意. 余之隨來. 始以兪泓窟爲限. 迢迢而來. 未覺其疲. 至此而興益濃. 至殊不欲斂興孤返. 而自量脚力亦可以前進. 遂以同造鳳頂爲期. 老子於此. 興復不淺. 古人實先獲之矣. 入門迤左而行路益枳澁. 自頃大雨水後. 澗道翻換. 木拔磴壞. 無可改軌. 大率槎枒間霜葉紛披. 尤易蹉跌. 步步戒心而過. 北有小瀑. 高可十餘丈. 承以白石. 磊磊可供息疲者一賞. 對嶺有長瀑. 層累滴瀝而下. 不甚愜目. 而以其互發而可記也. 五里至氷壺洞口. 自此捨大澗而南. 則方爲鳳頂蹊也. 歊火巖間爲攤飯所. 散步入洞. 洞然數百步. 不雜亂礫. 以一石竟谷. 而素湍橫拖. 舋舋引興. 殆欲忘歸. 澗南有小窟. 是採藥者所經宿. 天台賦所謂凝思幽巖. 朗詠長川者. 惟此可以當之. 飯後就微徑而南. 始甚曖然若不可尋. 而往往因僧徒累石而置標. 得以尋去. 松檜悄蒨中. 涓流成瀑. 屢憇其側. 北望群峰. 皓然若玄圃積玉. 晶炯奪目. 不可名狀. 每一進步. 輒一回顧. 岑巘之遞面呈奇者. 不定厥態. 方且指點之不暇. 突兀在前. 又是無限化城. 去秋來遊時. 斗奚實從焉. 故擧目諸嶺. 指其一峰最秀者曰直此爲鳳頂. 同遊者無論初造與再到. 皆有邁往之意. 不繼以倦. 遂令斗奚與閑衲先往辦飯於菴中. 而余輩徐步隨行. 轉眄間迷惑失蹊徑. 捨澗道而迂登岡脊. 毫釐朔南之錯. 只坐無眞見. 而擿埴不已. 乃困于石. 遂大呼斗發者三四聲. 山響而已. 摵摵林動. 倚樹呼不已. 始若有半嶺嘯聲. 俄而斗奚閑衲俱下來. 譁然迎慰曰幸矣不遠而復. 危不免巖底一宿矣. 引到大藏巖下. 巖以疊石秩秩. 頗類經藏故得名. 巖西南而望. 群峭森列. 飛走趨揖. 備見群物換態. 東納灝氣. 淼然天與海相接也. 登登數百步. 仰見天門闖開. 一衲披雲而下. 始知菴近且不空也. 力憊一蹴. 斯爲塔臺之北矣. 大海滿眼. 群山皆脚下. 剛風吹人. 若將飄擧. 僧立於傍. 遙指直北烟雪之閃閃者曰金剛九井峰. 余才自是中來. 故意益飛動. 是臺據一山高處爲総腦. 東覽扶桑. 北挹楓嶽. 皆襟袍中物. 論其勝致. 可謂絶特無比. 而然其爲臺. 欹窄臲卼. 有妨於姿意盤旋. 是固一欠也. 又以其太高. 故群峰之鸞翔鳳舞. 只撫其背. 猶有內障. 故大瀛之鯨跳鵬浴. 未睹全面. 若復進步乎靑嶂以上. 則方可睹萬殊一本. 亦可上無天而下無地. 是與金剛之毘盧同一地位. 然則是㙜也. 擬諸毘盧則稍低. 比諸正陽則過高. 高下通礙. 間有未愜賞而快意者. 造物之設爲妙有. 偶爾凝就耳. 責其圓全. 豈吾人眼目之太高歟. 劃然長嘯. 緣崖而南. 有塔嶤兀. 仍巖爲趺凡三級. 自古傳華僧慈藏者所建立. 而塔北隙地稍夷. 云瘞釋迦眞骨. 而塔南石罅. 若穿牛鼻. 云是往刦繫舟處. 其說尤極荒誕. 而亦不妨漫錄矣. 東下數百步爲菴子. 背負群巖. 儼若神衛. 一峰特臨屋. 山如鳳垂噣. 危乎欲墮. 菴之得名. 果以是也. 室凡數笏. 明淨可捿. 來自塔㙜. 滿身風霜之氣. 闔戶就燠而坐. 以解肌冷. 亦是一適. 留僧二人. 皆無識解. 一僧稍慧. 能談五㙜勝致. 淸軟可聽. 至昏燈上. 乍奏梵唄而止. 開戶見弦月如霜. 三人同登塔㙜. 嘯詠良久. 歎其月色甚佳. 而猶患山風過勁. 亂攬林壑. 若有飛氛蔽空者. 以此損澄寂之趣. 去秋之登斯㙜也. 適値圓月. 而猶欠朗徹. 合前後而通看則興可全矣. 移步塔北. 俯臨星河之垂海. 蕩漾不定. 相與拍手而歸. 仰看簷影. 又復叫奇. 卽鳳頂臨人頭也. 借榻經宿. 一僧趺坐于傍. 枕底翏翏天籟. 作海濤沸. 處地之高. 夢想盖非人世也. 天明催飯. 取道菴前. 將尋十二瀑布也. 余曾於二十年前. 尋瀑經歷于此. 而若墮渺茫. 閑衲自云一到而所歷絶險. 必騰空緣繘而下. 故借得繩索於菴僧. 遵澗而下. 遍谷皆叢栢蟠結. 步步罣礙. 乍跌則墜坑塡壑. 勢所必至. 約行五里. 斗臨絶壑. 閑衲所謂繘下處是也. 瀑懸數百仞. 窅不見底. 左側皆巨壁. 勢若截鐵. 無寸土可託足. 無尺木可着手. 雖有繘將焉用乎. 爭詰閑衲以非所當由. 則答以前日之陟. 較易於今日之降. 而自經雨水. 覺壁削愈甚. 亦無奈何. 不如迴策. 復尋閉門巖路. 同行旣魂(?)於絶冥. 又將敗尋瀑之興. 擧皆落莫. 咎其引路不審. 閑衲始言昨見微徑之橫于塔底者. 似或尋瀑一路. 試覔乃已. 遂披拂迤西而去. 越一岡脊. 路稍分若藕斷絲連. 至其稍微. 喜遇石標. 以不迷行. 四五里始抵澗道. 則水淸石白. 頓令心目開朗. 可知十二瀑不遠. 遵澗而行. 屢得佳處. 潭瀑相連. 呑吐若水晶甁流出. 最後一瀑. 尤奇麗. 閃閃楓林間. 練飄簾颺如也. 然猶非十二數內也. 過此則溪水赴隘勢駛. 而崇嶺千仞. 自南馳下. 與相交互. 於是雙瀑同落于一潭. 東出者人與俱來. 可知其源. 而南出者若從天降. 莫測其來處. 量其高東短而南長. 短可三十丈. 長可百丈許. 南瀑之上更加三層飛流. 縹緲空濛. 與紫翠無際. 非遠目可窮其狀. 稍稍緣磴而西. 匍匐致身于潭側. 細觀其雙瀑形相. 大類雄虹雌霓. 同飮露井. 而翩躚乎鷺舞龍騰. 雙對而不相薄也. 如潭之窄不足受其變態. 故汪然百間. 方始稱其量而著其奇. 溢爲下潭. 廣亦如之. 上方下圭. 各一形制. 而上下遞觀之際. 鎔鍊巧妙. 有瀑承焉. 高可十餘丈. 風捲霏微. 被朝霞所閃射. 輒有晴虹騰起. 潭邊白石. 皎若霜雪. 海松數株. 散陰其上. 尤覺森爽. 恨無由跳過翺翔之也. 盖余前後三造. 而今覺絶勝倍之. 一雨所漱濯. 可謂天奉我也. 下潭之溢. 又爲落瀑. 亂擣龕中. 中分爲雙紐. 隔溪望之. 所見甚奇. 種種難摸寫如此. 遵此而下. 接乎耳目者. 雷吼雪濺. 無非是瀑. 指不可勝屈. 但未知所謂十二者. 自何截斷也. 自鳳頂至雙瀑幾二十里. 自雙瀑又十五里而後爲上水簾. 石面瑩滑. 長瀑拖其上. 承以圓潭. 匝以疊嶺. 品題其勝. 可居中上. 遂布氊于石. 列坐澆飯. 南望一石撑空. 迢迢玉立. 隱約是雙瀑上頭也. 稍下又得佳處. 石白如珂雪. 而周折爲屛帳形者凡七八疊. 刻劃工緻. 所欠潭狹岸仄. 遊目意短. 再行五里. 至下水簾. 是余第一會心處. 層峰疊嶂. 左右負勢而起. 略不相讓. 中開洞府. 宏敞灑落. 上下數百步. 圓潭廣瀑. 淺瀨回灣. 盤石振崖. 嵌广平壇. 安頓得所. 曲有意致. 谷口洞然. 橫亘以一帶銀城. 卽高明岾也. 東崖妥帖處. 曾與趙君錫枕流對睡. 欲名其處曰希夷臺. 臺西有小澗潺涓. 被以蘿葛. 蒙密礙眼. 今忽豁然爲大洞. 排一泉石. 奇上添奇. 實若有神設者. 宜名其洞爲龍開. 而水簾上占一土阜. 擬因樹爲屋. 滅景於此間. 果成斯計. 則永矢菴作一蟬殼矣. 谷口有槽潭磴甚欹仄. 每歷心悸. 因雨棧削. 別取道岸上. 邐迤而抵兪泓窟. 未暮返永矢菴. 自余爲是山主. 凡在百淵源流與大小雪嶺. 皆所籠而有之. 杖屨可隨意. 而至於鳳頂及雙瀑則以其絶險而難中宿. 日力窘於直達. 故除壬申一探外. 始有昨年之踐. 則其跡可謂踈矣. 盖雖烟霞癖重. 而衰年愛脚力. 不得不如此. 從今又加以老疾俱至. 則只須曠臺矯首. 目送歸雲而已. 古人所謂能得幾回過者. 有足慨歎. 不有起余者. 其孰能振頹乎. 余實以比年重賞爲幸. 且念爾致與和叔逖矣京輦之蹤. 邂逅湊着. 斯已難矣. 况四節而値素秋. 且重九也. 一宿而得朗月與晴旭也. 適又百年一雨. 巖流大經盪滌. 潦盡潭淸. 霜肅楓明. 種種刮目而洗胸. 不啻四美之爲幷. 雖欲忘言得乎. 余素懶於筆札. 五遊楓嶽. 六年栖此. 而曾未撰一遊記. 被人提掇而亦不能强. 今乃因興口占. 使致也執筆寫去. 持示于在洛諸子姪. 俾知余老而愛山. 於是乎興劇. 而若其原本融峙. 品題雲嵐. 庶補碑版之闕遺. 則欲登玆山者. 持爲杖鞋之引亦可矣. 辛卯九月重陽日. 百淵洞主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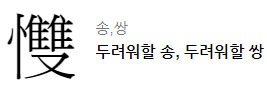
-
- 이전글
- 설악일기(雪岳日記)
- 24.02.06
-
- 다음글
- 유풍악기(游楓嶽記)
- 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