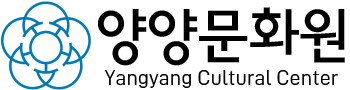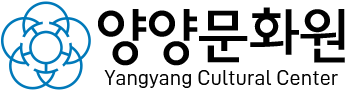340.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금원 김씨(錦園金氏) / 한글 번역
페이지 정보
본문
나는 관동(關東)의 봉래산(蓬萊山) 사람이다. 스스로 금원(錦園)이라 호를 하였는데, 어려서 잔병이 많아 부모가 불쌍하게 여겨 여자가 해야 할 가사나 바느질은 가르치지 않고 글공부를 시켰다. 글 공부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사(經史)에 대략 통하게 되고 고금의 문장을 본받아 배워 흥이 나면 때때로 시문(詩文)을 짓기에 이르렀다.
가만히 내 인생(人生)을 생각해 보았다.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실로 다행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되 야만인이 사는 곳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 은 문명국에 태어난 것은 더욱 다행이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요,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불행이다. 그러나 하늘은 나에게 산수(山水)를 즐기는 어진 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 력을 주어 다만 산수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고절하게 보고 듣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총명한 재주를 주어 문명(文明)한 나라에서 이를 글로 쓸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또한 좋지 않은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閨房)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에 이름을 날릴 것을 단념하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세상에는 첨윤(詹尹) 의 거북이 없으니 굴자 (屈子) 가 점친 것을 본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 말에 이르기를,
“책략은 짧으나 지략이 넉넉하거든 그 뜻대로 결행하라.”라고 하였으니 내 뜻은 이에 결정되었다.
아직 혼기에 미치지 아니 한 나이에 강산(江山)의 승경(勝景)을 두루 보고 증점(曾點)을 본받아 세속의 일 다 잊고 맑은 물에 멱 감고 무우(舞雩)에 올라가 글을 읊조리다 돌아 오면 성인도 온당하다 할 것이다.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 이름 있는 명승지를 찾아 맑게 유람할 것을 정하였다. 어버이에 게 이 계획을 사뢴 지 오래 되어 겨우 허락을 얻었다. 어렵게 받은 허락이라 마음이 후 련하기가 마치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새장을 나와 끝없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기 분이고, 좋은 말이 굴레와 안장을 벗은 채 천리를 달리는 기분이다.
간성(杆城)으로 길을 바꿔 청간정에 올랐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계곡의 시내라는 뜻의 '간(澗)'으로 이름을 정한 그 뜻을 알 수 없다. 정자 앞 바다 물속에 돌이 있는데 거북이 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거북바위라 부른다. 그 거북바위 가운데에 자마석(自磨 石)이라는 돌이 있는데 돌 위와 아래에 마치 이제 막 작게 쪼아 낸 것 같은 돌이 있어 큰 것은 살구 잎만 하고 작은 것은 동전만 하다. 자마석이란 위아래의 두 돌이 엇갈려 이들을 갈아낸 것이라고 일러진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두 돌의 사이가 거의 한자 이상이나 되니 어찌 서로 갈 수 있겠는가? 그렇더라도 만약 먹으로 여겨 글자를 쓴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갈아 없어질 것이라고 하니 그 이치를 깨닫기 어렵다.
정자 위에 앉아 월출을 보고자 했다. 닭이 울 때가 되자 홀연히 바다 구름이 영롱해지면 서 반원의 달이 숨을 듯 드러날 듯 살포시 그 얼굴을 드러냈다. 찬란한 빛이 구름 끝에 서 토해져 나오는데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바다 위를 두루 비추는 듯하다가 갑자기 푸른 유리 만경이 아름다운 정자 맑은 대청 앞에 펼쳐진 듯했다. 마지막까지 모두 드러나자 맑은 바람 서늘한데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리하여 차 끓이는 아이에게 차를 들이도록 하고 먹을 갈아 시 한수를 썼다.
하늘 푸르게 터져 저녁 구름가로 片天靑綻暮雲邊
천지개벽 그 순간 온갖 물상 한가지로 새롭고 萬象新同開闢年
할 일 없는 아이종은 차 끊이니解事奚童將煎茗
소나무 가지 사이 비친 초생달 받으며 맑은 샘물 긷네 漏松缺月汲淸泉
창에 붉은 햇살이 비추고 추녀에서 새들이 어지럽게 우니 비로소 봄잠에서 깨어났다. 푸른 바다 굽어보니 운무 걷혀 그 끝 측량할 길 없어 더욱 천지의 거대함을 깨닫게 되어 스스로 부평초 같은 인생이 창해의 일속임을 한탄했다.
양양(襄陽) 낙산사를 찾았다. 푸른 산이 사방으로 둘렸는데 소나무 잎만 무성했다. 관음 사는 바다 위에 있는데 한쪽은 언덕 귀퉁이에 의지해 있고 한쪽은 기둥을 바다 쪽에 세 워 허공에 얹어 절을 지었다.
법당은 굉장한데 불상은 흰 비단으로 감싸 놨다. 마루 가운데 나무 판때기에서 바닷물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내려다보니 석굴 속에 울리는 소리는 마치 갠 하늘의 우레 소리 가 산악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협창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물빛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데 산과 내의 경물이 모두 그림 속에 있는 듯하다. 흰 갈매기들이 하늘을 선회하며 내려 앉는 것도 역시 하나의 기이한 경관이었다. 바닷가의 여자들은 모두 나이 먹은 사람들로 하나같이 맨발인데 산부추를 뜯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상선들이 자주 푸른 물결 속에 출몰하고 있었다. 포구 주변의 시골집들은 대부분 고래의 뼈로 절구를 만들었으니 그 고래의 크기를 알 수 있었다. 물개가 많이 물 밖으로 나와 바위 위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모두 검은 색으로 모양이 같았다. 물개는 사람을 보면 짖 고 가까이 가면 곧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의경대(儀景臺)에 올라 일출을 보려고 했다. 닭이 몇 차례 울자 멀리 바다와 마주 친 하 늘을 보았다. 운애만이 아득하여 잠시 걷히기를 기다렸으나 모든 것이 고요한 채 조금도 변하지 않으니 하늘을 가린 구름이 마귀노릇 하는 것 같아 한스러울 뿐이었다. 한(漢)나라 이심(李尋)은,
“날이 밝아지려 하면 맑은 이 뭉게뭉게 음화(陰伙)를 펴낸다. 그래서 바다에서 해를 보 려면 해는 대부분 구름 기운〔雲氣〕에 의해 가려지게 되니, 어찌 그의 어두운 기가 아 직 흩어지지 아니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구름이란 물의 기운이다. 바닷물의 기운이 태양에 의해 부풀려져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되 어 떠돌며 날다가 어슴푸레 밝아지려 할 때 진탕하는 것이다.
조금 있자 홀연히 붉은 거울 하나가 바다 속으로부터 불쑥 솟아올랐다. 구름 끝이 아래 로 늘어져 있는 곳에서 점차 올라옴에 빛이 회오리쳐 끓으며 백옥 같은 쟁반에서 진주를 높이 들어 올리는 듯한데 잔잔한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저편에서 붉은 비단 일산 처럼 가볍게 흔들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흐린 구름 기운을 뚫고 빠르게 둥근 바퀴가 그 대로 솟아오르니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미친 듯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출 듯했 다. 상서로운 햇무리가 아래로 해면을 비춰 한바탕 붉은 구름을 부풀리다가 또 다시 평 지로 쏟아지니 위아래가 온통 붉은 색으로 젖어 마침내 하늘과 땅을 한 덩이 불꽃으로 만드니 참으로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한편의 절구를 얻었다.
해는 연자처럼 바다위의 하늘 구름 깨뜨리고 紅輪碾破海天雲
얕게 떠올라 자꾸자꾸 치솟네 且得竿餘轉運頻
물 긷고 땔나무 지고 가는 시골 골목길 汲水擔薪材巷曲
뽀얀 안개 속 붉은 노을 비쳐 가벼운 티끌 적시네 涳濛瑞霭浥輕塵
강릉으로 길을 바꿔 경포대에 올랐다. 단청 누각이 반공(半空)에 우뚝 솟았는데 호수의 잔잔함은 거울 같고, 이제 막 씻어 놓은 듯한 물밑의 맑은 모래는 셀 수 있을 것 같다. 푸른 산을 비단에 놓은 수 같고, 해안의 모래는 주옥같은데 늙은 소나무들 우뚝하고 푸 른 버들가지 하늘하늘 늘어뜨리고 있는데, 꾀꼬리는 울고 해당화 붉은 색 토해 놓아 그 광활한 모양과 아름다운 경치는 말로 그려낼 수 없었다. 고을은 사람이 많이 살고 번화 한 곳인데, 충효의 정려문이 굽이마다 벌려서 있어 요임금 순임금의 덕치로 백성들이 모 여들어 즐비하게 집을 짓고 사는 아름다운 봉지를 이곳에서 오히려 볼 수 있다.
몸 돌려 울진(蔚珍)으로 향해 망양대(望洋臺)에 올랐다. 대는 바다 위에 있는데 눈앞이 탁 트여 종일토록 눈 미치는 곳까지 바라보아도 하늘 끝 뵈지 않고 거친 파도가 물방울 만 토해 놓으니 날리는 것이 흰 눈과 같아 은하수가 흩어져 떨어지는 것처럼 온 천지에 부슬부슬 뿌린다. 바다 속 섬은 파도에 뒤흔들리는데 밝은 태양 아래 우레 소리만 천지 를 진동한다. 옛날 바람 속 파도의 험함을 양후(陽候)의 파도라 일컬음은 이것을 이름이 아니겠는가? 상선들이 미친 듯 몰아치는 파도와 노한 물결 속에서 출몰하는데 이를 볼 때마다 위태로운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 자신도 모르게 놀라 부르짖게 되었다.
평해(平海)를 향해 가서 월송정에 올랐다. 바람 고요하고 물결도 멈췄다. 날씨 청명하여 멀리 섬을 바라보니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푸른 색깔만 하늘에 맞닿아 있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오직 바다의 무한한 기운만을 깨닫게 해 사람으로 하여금 감회를 일으키게 한다. 덧없는 세상 사람의 생, 가련할 뿐인 것을!
삼척(三陟)으로 가서 죽서루에 올랐다. 오십천(五十川) 흐르는 물이 멀리 태백산을 감싸 돌아 동해로 흘러들어 간다. 천지조화의 현묘함이 하나하나마다 몹시 기이하여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돌아가는 것마저 잊었다. 진기한 새들이 쌍쌍이 나는데 대부분 이름을 알 수 없었으나 아름다운 곳의 금수라 어찌 범상한 금수와 다르지 않겠는가?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함께 하기 어려우나 바로 이곳 수 백리 안에서 천하의 두 기이함을 함께 본다. 산은 1만 2천 봉에, 바다는 삼일포 총석정, 해금 강에 우연히 천지의 정채롭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쏠려서 빛나 인자(仁者)와 지자(知者)의 즐거움을 함께 하니 관동에 들어오지 않고는 천지의 온전한 공을 볼 방법이 없을 것이다.
팔경(八景)에 대해 중요한 곳을 대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으나 그래도 미련이 있어 인제 (麟蹄)에 이르러 설악산을 찾았다.
돌들 불쑥불쑥 솟아 하늘에 닿았고, 산봉우리들 우뚝 벌려 있는데 돌들 희기가 눈 같아 '설악'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돌산들이 천겹으로 아득히 솟아 험하다. 돌을 가르는 물은 만으로 굽어졌는데 조용하고 깊숙한 곳을 흐르는 그 물은 차고도 맑다. 계곡 물을 건너 자꾸 산길 돌고 도니 일천 봉우리는 빼어남을 다투고, 우거진 교목들은 하늘을 가렸다. 늙은 소나무에서는 학이 울고, 사슴은 풀숲으로 내닫는다. 신선이 산다는 요지(瑤池)요, 낭원(琅苑)이요, 봉래(蓬萊)요, 방장(方丈)이다.
계곡물을 끼고 좌우에는 붉은 철쭉이 빽빽하게 피어 흐르는 물에 짙게 비쳐 있어 긴 무 지개가 드리운 듯하니 옥천(玉泉)에 드리운 무지개도 이곳보다는 낫지 못할 것이다 옥 천은 연경의 옥천산(玉泉山) 아래에 있는데 샘이 구슬을 뿜어내는 듯하여 분설(噴雪)이 라고도 한다. 물이 괴어 못이 되었는데 넓이는 3장(丈) 남짓하다. 연경 팔경의 하나로 옛 날에는 옥천수홍(玉泉垂虹)이라 했는데 지금은 옥천박돌(玉泉趵突)이라 한다. 위에 비석 이 있는데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이라 쓰여 있다 하였다. 내가 비록 보지는 못했으나 그 드리워진 무지개의 모양도 이 기막힌 절경에는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산이 가파르게 깎여 하늘에 닿아 있어 조심조심 나아가 그 꼭대기에 오르니 대승폭포 라고 이르는 것이 반공에 걸려 아득히 늘어졌는데 진주처럼 곱고 부서진 옥처럼 아름다운 물방울이 좌우에 뿜어져 한낮의 우레 소리와 함께 이슬비처럼 자욱이 내리고 있었다. 그 쏟아져 날리는 기세는 바람의 신이 연출하는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장관이니 중국 여산(廬山)의 안암(鴈岩)과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폭포는 삼천 척(三千 尺)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 이백(李白)이,'날아 흘러 떨어지길 삼천 척 〔飛流直下三千尺〕 마치 은하수가 구천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疑是銀河落九天〕'이라고 읊은 구절은 바로 이 폭포의 신기함을 전하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흰 비단이나 백설(白雪)도 오히려 평범한 말일 것이며, 옥룡(玉龍)이 은빛 무지 개를 허리에 둘렀다고 하면 혹시 그것에 가까울는지 모르겠다.
우비와 모자를 쓴 김에 가까이 가서 폭포를 보려고 하니 날려 쏟아져 튀어 흩어지는 물 방울이 한없이 모자 위에 날아왔다. 소리는 우레가 치는 것 같고 물방울은 모자를 뚫을 듯해 비록 물방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놀라고 두려워 진정할 수 없었다.
아침 안개가 허공에 가득하여 숲과 골짜기를 분간하기 어렵다. 산봉우리들이 구름 사이 에 나타났다 가려졌다 하니 마치 푸른 옥을 깎아서 그림 병풍을 둘러놓은 듯하다. 조금 있자 검은 구름이 비로소 걷혀 달은 밝고 바람은 시원한데 산봉우리와 바위의 온갖 기 이한 모양들이 전부 내 눈앞에 나타났다. 한편의 시를 얻었다.
천봉 우뚝 서 하늘 찌르는데千峯突兀䅤天餘
가벼운 안개 퍼지니 그림 같지가 않네輕霧初敍畫不如
이 곳 설악산 기막히게 좋은 곳이니好是雪岳奇絕處
대승폭포 곁에 초막 하나 지었으면大乘瀑㳍勝庭廬
백담사(白潭寺)로 들어가 잠깐 쉬었다가 수렴동(水簾洞)을 찾았다. 수석(水石)이 역시 기이하고 장대하다. 설악에는 옛날에 김 삼연(金三淵)의 영시암(永矢閹)과 김 청한(金淸 寒)의 오세암(五世菴)이 있었으나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아 비록 볼 수 없지만 설악의 이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더욱 알려져 금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산과 바다의 기이한 장관을 이미 두루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화려하고 번화한 곳을 보고자 마침내 서울로 향했다.
-
- 이전글
- 339.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함벽당(涵碧堂) 유경시(柳敬時)
- 25.02.24
-
- 다음글
- 340.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금원 김씨(錦園金氏) / 한문 원문과 저자 소개
- 25.02.24